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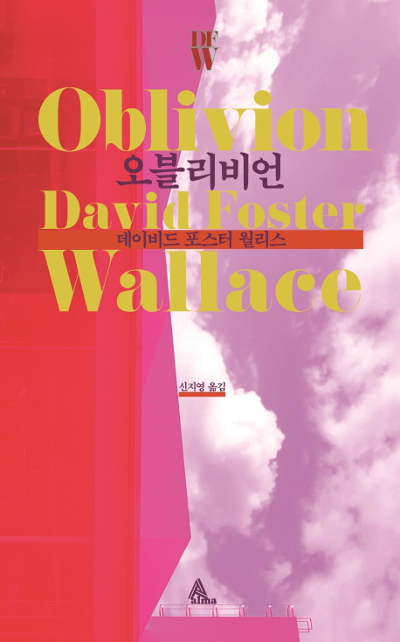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박준의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슬픔은 나의 자랑이었다. 나뿐만 아니었다. 친구들이 그랬고 이웃들이 그랬고 직장 동료들이 그랬다. 20대 때의 술자리에선 누가 진정한 슬픔의 왕인가, 굴곡진 개인사들로 내기 아닌 내기가 벌어지기 일쑤였고, 30대 때의 술자리에선 누구의 직장 생활이 가장 고된가 서로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질곡 없는 이가 없었다. 누구나 마음 한쪽에 저장해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말 그대로 삶을 돌아가게 하는 연료 내지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슬픔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인류에게 오랫동안 널리 읽혀온 고전은 물론이고, 지금의 우리가 공감하고 사랑하는 현대의 문학들은 대부분 비극이다. 나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혹은 미쳤다고 생각되는) ‘좁은 문’이나 ‘이방인’ ‘변신’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가 교과서로 읽었던, 지금의 성장 세대가 교과서로 읽고 있는, 예컨대 국민 소설 ‘소나기’나 ‘마지막 잎새’ 같은 산문에서부터 김소월 윤동주 이육사의 운문에 이르기까지의 문학 작품들은 하나같이 비극이다. 당신이 허무주의자나 냉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자신의 삶 안에서 허무를 경험했을 것이며, 비극적인 문학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에 공감한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당장 떠오른 문학 작품의 제목 하나만 입 밖으로 뱉어보라. 감히 장담컨대 그건 99.9% 비극일 것이다.
최근 국내에 출간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소설집 ‘오블리비언’은 신선하고 기발한 형태의 비극 여덟 편을 담고 있다. 오블리비언(oblivion)이란 단어는 ‘망각’ 혹은 ‘공허’를 뜻한다. 이는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하다. 작가 특유의 세밀하면서도 견고한 관찰과 묘사를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독특한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여덟 개의 작품 중, 가족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현대적 비극을 주도면밀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묘파해낸 단편들이 특히 내 눈에 들어왔다. ‘화상 입은 아이들의 현현’과 ‘철학과 자연의 거울’, 그리고 이 소설집의 표제작 ‘오블리비언’ 같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화상 입은 아이들의 현현’은 어느 집에서나 벌어질 법한 한순간을 ‘그저’ 관찰한 엽편소설이다. 작가의 시선으로 그저 관찰하고 기록했을 뿐인데도 작가의 밀도 있는 구성은 읽는 이를 압도하며 주인공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전한다. 부모의 실수로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응급실로 향할 때까지 독자들은 모든 구성원의 통증을 오롯이 전달받는다.
‘철학과 자연의 거울’과 ‘오블리비언’은 각각 주인공과 어머니의 관계, 주인공과 장인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묘한 비극적 상황들을 유쾌한 방식으로, 혹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자는 성형수술 실패로 얼굴이 흉측해진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아들의 이야기, 후자는 아내의 새아버지와 골프장에서 직면한 상황들에서 분노와 피로를 느끼는 이야기다.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가족에게서 기인한 비극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해결은커녕 더 큰 난관에 빠진다.
일상적으로 ‘해피엔딩’을 꿈꾸는 인간은 모순적이게도 ‘새드엔딩’을 사랑한다. 나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인간은 왜 비극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나의 범박한 결론은 이렇다. 비극, 즉 슬픔이란 것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은 비극을 사랑한다. 슬픔의 반대편에 무수히 많은 감정이 놓여 있겠지만, 슬픔의 반대말을 단답형으로 기쁨이라 할 때, 우리는 기쁨을 확인하기 위해 그 반대 개념인 슬픔을 이용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슬픔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곳으로부터 탄생하기 마련이다. 먼 친척이나 이웃의 죽음보다는 내 부모의 죽음으로부터, 남의 자식의 고통보다는 내 자식의 고통으로부터. 위대한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관계 형태인 가족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슬픔이 아닐는지.
<임경섭·출판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