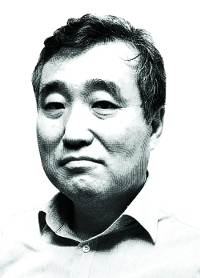
내각 무력화하고 여당 존재 미미하게 만드는 비서정치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념만으로 하는 국정 운영은 결국 오만에 빠지는 길
비서정치보다 내각·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장관이란 무엇인가. 최고위 정무직 공무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국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 부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다. 그런 그에게 애당초 책임의 한계란 없다.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수습하고 처리하고 정무적인 사항을 포함해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런데 회피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할 능력이 없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나 홀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출입기자 없는 회견장에서 혼자 8분 동안 회견문을 읽고 나갔다.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유야 어찌됐건 장관의 책임과 엄중함이 사라진 가벼움이다. 텅 빈 브리핑실에서 혼자 허공에 대고 말하는 장관의 사진, 무기력한 문재인정부 내각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요즘 이 정부 대부분 주요 장관들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나 북·미 관계와 관련해 비켜 있다. 그 공간을 청와대가 차지한다. 4강 외교 등 굵직한 현안에 있어 외교부 장관의 비중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는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한다는 건지, 바꾸겠다는 건지. 부지런히 돌아는 다니는데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무엇을 해결했는가는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에 대한 방향성 제시 같은 것을 거론하지도 못한다.
내각은 왜 이렇게 약한가. 청와대의 비서정치 때문이다. 정의와 공정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초기엔 적폐청산도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이니 맘대로 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사 털기, 자기편 인사 챙기기에 주력해 왔다. 모든 것은 청와대로 통했고 관료사회는 청와대 눈치만 보고 지시만 기다렸다. 장관은 사라지고 청와대 비서들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의 방향과 강도를 짐작케 했다. 잇따른 인사 참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건 비서정치의 한 단면이 ‘재수 없게’ 드러난 사례일 뿐이다.
요즘은 뜸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의 SNS 정치는 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여당의 힘만으론 안 된다. 국민이 도와 달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지금까지 이런 수석은 없었다. 자기정치를 하려면 청와대에서 나와 출마할 지역구에 가서 하는 게 옳다. 그가 조용하니 다른 이들이 나선 것 같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국민의 몫으로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국회만 없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서정치요 자기정치다. 비서정치의 횡행은 여당의 존재도 미미하게 한다. 여당에 말해봐야 소득이 없으니 야당이 청와대만 상대하려 하고 청와대와 부딪힌다.
비서정치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 아닌가. 대통령이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장관을 찾고 여야 의원의 조언을 구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게다. 비서들과 논의하고 지극히 업무적인 국무회의 지시만 있다면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다. 비서들이 써준 ‘축사정치’는 성공률이 낮다.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허공을 맴돌다 끝난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어땠는가. 문고리 3인방의 위세로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장관의 의사 전달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정권은 붕괴했다.
대통령은 비서정치보다 내각정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내각정치와 함께 정책 추진과 성과 내기에 훨씬 효과적인 의회정치를 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들만의 힘으로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정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도 않는다. 행정부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 비서정치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니 관료집단은 청와대 지시만 기다리고 토를 달지 않는다. 실제로 무서워 그러는 건 아닐 게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비서정치의 폐해와 한계 때문 아닐까. 어느 여당 고위 정치인 말대로 군기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비서정치는 비서 외엔 누구나 싫어한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건 비서정치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됐다는 신호다.
신념만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는 없다.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그 성공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아널드 토인비는 ‘휴브리스’(hubris·오만)라고 불렀다. 휴브리스는 그 오만이 추종자들에게 복종만 요구하며 남의 말에 귀를 막아 균형감을 상실하고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판단력도 잃게 되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권력만 잡으면 이 고질병에 걸리는가. 더구나 자신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게 아니지 않은가.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허탈이, 일부 보수정치의 천박함이 ‘창조적 소수’를 만들어낸 것뿐이다. 집권 3년 차, 야당뿐 아니라 대통령과 비서들도 성찰이 필요하다.
수석논설위원 mh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