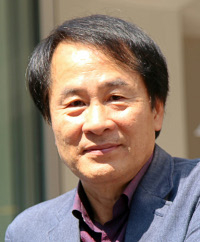
둔촌 주공아파트는 1980년에 완공되었다. 가구 수가 6000에 가까웠다.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이주가 이루어져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주자들이 떠난 지 1년이 더 지난 2019년 5월 현재 단지 내 건물들은 아직 그대로 있다. 아마 곧 철거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1년여 전까지 나는 그 아파트의 주민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15년을 살았다. 내가 이사 갔을 때 그곳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작가인 조세희 선생을 비롯해서 몇 명의 소설가가 살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시인까지 포함해서 둔촌동에 사는 문인들이 동네 삼계탕 집에 처음 모인 것이 아마 내가 그 아파트 주민이 된 다음 해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5년이나 된 일이다.
첫 모임 이후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만나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대체로 가벼운 담소와 실없는 농담 일색이었으나 조세희 선생을 모신 자리는 때때로 시국 강연이나 진지한 문학 토론장이 되기도 했다. 사는 동네 이름을 따서 둔촌동 모임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둔촌동에 살지 않는 이들이 뜨문뜨문 합류했다. 그러고 나서도 둔촌동 모임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다. 사실은 모임의 이름을 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웃에 사는 문인들끼리 가끔 만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전부인데 이름이 왜 필요했겠는가. 아무도 둔촌동에 살지 않게 된 지금도 여전히 둔촌동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에 우리는 둔촌 주공아파트의 초창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파트 주민이었던 조세희 선생님을 기억하는 공간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 어딘가에, 가령 ‘난쏘공 공원’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차례 주고받았다. 정확한 해는 모르지만 선생은 이 아파트가 건설된 1980년대 초에 입주했고 이주가 결정된 재작년까지 30년 이상을 여기서 살았으니 그 역사를 기억해 두는 것은 새로 지어지는 둔촌 아파트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였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나누기만 할 뿐 실제로 어떤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했거니와 아이디어라면 몰라도 나서서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무능력한 자들이 글쟁이들이기도 했다. 또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일종의 세속적 동상 만들기 같은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고, 선생의 올곧은 문학 정신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극성을 띠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생이 이런 후배들의 생각을 좋아하기는커녕 나무랄 게 틀림없다는 판단도 구체적인 행동을 망설이게 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원고를 태워 버리라는 유언을 지키지 않고 책을 출간한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나 사후에 발견된 트렁크 속의 엄청난 원고들(살아 있을 때 출판을 망설인 것이 분명한)을 세심히 살피고 분류해서 책을 펴낸 페소아의 지인들을 생각하면 작가의 의사를 배신한 어떤 선택에 공익적 성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작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책들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사람, 특히 작가나 예술가의 이름이 한 도시의 상징이 되는 일은 흔하다. 사람들은 가우디를 보려고 바르셀로나에 간다. 내가 작년에 1년 동안 살았던 엑상 프로방스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잔의 자취를 찾아다닌다. 모네의 정원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가 지베르니에 갈까. 어떤 사람은 더블린을 제임스 조이스의 도시로, 리스본을 페소아의 도시로 기억한다. 누군가는 엘 그레코를 보기 위해 톨레도로 간다고 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설국’의 무대인 니가타 현으로 우리를 부른다. 고흐를 찾아 아를에 가고 오베르에 간다. 그 이름들이 그 도시들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셈이다.
서울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러 오는 것일까. 강동구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러, 혹은 누구 때문에 찾아가는 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새로 지어지는 둔촌 아파트의 한 귀퉁이에 ‘난쏘공 공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해보는, 상상에는 빠르지만 추진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소설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아이디어다. 혹시 아는가. 정말로 그런 것이 생기면 가깝고 먼 곳에서 사람들이 ‘난쏘공 공원’을 보려고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으로 일부러 찾아오는 일이 생기게 될지.
이승우(조선대 교수·문예창작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