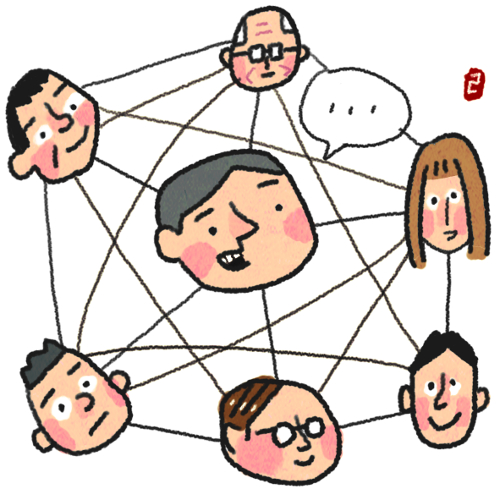
베를린에 잠시 머물 때, 한 강연에서 내가 벤야민을 인용하는 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청중이 있었다. 내가 공자나 맹자, 아니면 퇴계 이황을 예로 들 것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나는 내가 배워온 유럽 중심 철학이 문제인지, 나에게 요구하는 동양인다움이 문제인지 잠시 헷갈렸다. 세상에 거대한 중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진 주변에 대한 시선. 거개의 차별은 여기서 비롯되는데,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이 동양인에게 바라는 ‘동양다움’ 역시 또 다른 폭력인 셈이다.
이처럼 차별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내가 인종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젠더 감수성을 가졌다는 것이 퀴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뜻도 아니다. 그 감수성이 한 번 획득되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도 아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혐오의 양상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점검해야 하는 수많은 일 중 하나일 뿐.
나 역시 비슷한 잘못을 하며 살아왔다. 친근함과 순수함을 표현하려고 장애인이나 소수자 혐오와 관련된 말을 습관처럼 쓰던 때가 있었다. 물론 그런 단어만으로 상처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폭력이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권력 역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말일 뿐, 일상적인 삶에서는 모두가 건강한 일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 인격성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말을 비유랍시고 사용하는 것을 언어 관습이라며 용납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표현들은 말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조적으로 소외시킨다. 물론 이렇게 경직되어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미학적 방법론을 들며 문학적 ‘허용’을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정작 그도 자신의 말이나 글로 누군가를 경직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폭력성을 가진 ‘미학’도 거짓이다. 매사 점검하는 건 불편하다. 그러나 내가 편하게 썼던 말들 앞에서 누군가는 평생 불편했으리란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에게 상상력이 있는 이유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신용목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