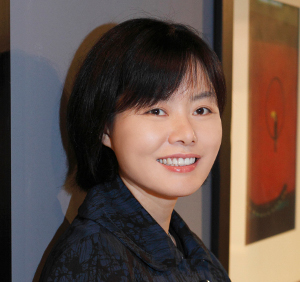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하게 되는 책 중에 롤랑 바르트가 쓴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La Chambre claire: Note sur la photographie)’가 있다. 책 제목에 ‘사진’ ‘노트’라는 단어가 눈에 띄기도 하고 시집처럼 가볍고 얇아 사진기술개론쯤으로 생각해 쉽게 접근하게 되지만 첫 장을 넘기기가 어려운,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보게 되는 책이다.
‘삶이 작은 고독의 상처들로 이루어져 있음’(p.11)을 불현듯 느낄 때, ‘사랑한다고 말하자마자 달아나버리는’(p.23) 연인을 바라볼 때, ‘미궁의 중심에서 오직 자신만의 아리아드네’(p.76)가 절실할 때 이 책을 쥐고 있었다. 바르트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며 애도의 작업으로 이 책을 쓴다. 사진론의 고전이지만 실은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인 삶과 죽음, 사랑과 시간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생생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밝고 환한 방에서 사유하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우리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사진 앞에서 골똘하게 한다.
‘밝은 방’에서 바르트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에 반응하는지 탐색한다. 그러면서 사진을 경험하는 두 가지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스투디움(studium)과 푼크툼(punctum)을 가져온다. 둘 다 라틴어이다. 스투디움은 일반적인 문법을 갖고 있기에 쉽고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푼크툼은 쏜살같이 나를 꿰뚫기 위해 온다고 언급한다.
스투디움이 ‘길들이기에 가까운’(p.31) 보편이 특성이라면 푼크툼은 ‘작은 구멍, 흠 혹은 그 자체가 나를 찌르고 상처 입히고 때리는’(p.32) 것이기에 아프고 어렵다. 그리고 스투디움은 좋아하는 감정이고 푼크툼은 사랑의 상태라고 덧붙인다. 사진을 찍는 주체는 사람인데 피사체(사진 찍히는 대상)인 사진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는 말이다.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 ‘주체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사진은 ‘나’라는 존재의 정립을 불가하게 하고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사진 촬영에서 기본은 대상에 닿은 빛이 반사돼 필름 혹은 메모리카드에 기록되는 원리이다. 즉 대상(사람, 사물, 사건 혹은 풍경)이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촬영하는 사람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거나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단순히 피사체의 겉을 미끈하게 복사할 것인가, 피사체가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것인가. 요컨대 사진 촬영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대상(타자)의 ‘있음’이고, 그러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 없는 사진과 관계맺음은 아름다운 사건이 된다.
사진을 찍고, 보고, 받고,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현대인에게 사진은 소통과 표현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는 사진 체험의 흔한 프로세스이다. 경험하는 것보다 찍고, 보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의 시각은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해상도가 높아 ‘이미지’에 먼저 반응하고 빠르게 무뎌진다. 예술의 전 장르에서 생산자와 향유자가 이렇게 과잉인 매체는 이제껏 없었다.
사진은 이미 우리의 안과 밖, 개체와 집단 모두에게 편재되어 있다. 이미지의 범람은 현실 세계에 파르마콘(Pharmakon)이 돼버렸다. 약이면서 독으로. 소통과 불통으로, 이해와 몰이해로. 정작 봐야 할 것에 눈을 감게 하거나, 이미 봤으므로 더는 안 봐도 되거나, 너무 봐서 식상하기에 더욱 선정적인 이미지를 찾거나. 수많은 사진들이 이-미지(未知)의 세계에 우리를 길들이고 잠들게 한다. 아니면 구경꾼에 머물게 하거나. 바르트는 사진의 수용미학으로 스투디움과 푼크툼을 제시하며 뭐든 쉽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사진 시대의 도래를 예감한 것이 아닐까. 이미 40년 전에 말이다.
만일 사진이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 좀 봐달라고 눈물짓는다면 우리는 그 사진을 아프게 계속 봐야 한다. 분명히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찍힌 것이니, 밝은 방에서 생생하게 깨어 사진 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최연하 사진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