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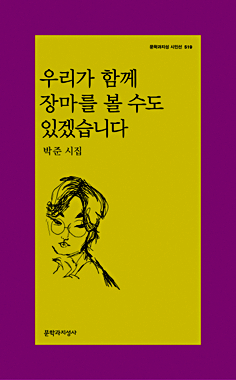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스스로 쓴 이 말처럼 시인 박준(35)은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문장과 마음에 스미는 시구를 남기고 있는 듯하다. 책 읽는 사람이 없다는 이 시절에 30만명 가까운 독자가 그의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2012)와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2017)을 찾았다.
6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문학과지성사)를 낸 그를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두 번째 시집을 내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했다.
그는 “거울을 보는 시간 같았다. 내가 좋은 시를 쓰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했다”고 했다. 첫 시집의 성공이 문학적으로 적잖은 부담이 됐던 것이다. 박준은 “2008년 등단하기 전에는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 ‘내가 남조선에서 (시를) 제일 잘 쓴다’는 자기 최면을 걸었다(웃음). 첫 시집을 낸 뒤엔 반대로 의심하고 회의하면서 느리게 썼다. 그렇다고 이번 시집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다. 새 책은 늘 불안하다”며 사뭇 진지한 얼굴을 했다.
사계절을 따라 4부로 나눠진 시집에는 그간 쓴 시 51편이 담겼다. 오래전 기억을 소환하거나 미래의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늠하는 시들이 많다. 제목이 나온 시 ‘장마’를 보자. 부제는 ‘태백에서 보내는 편지’다. ‘그들은 주로 질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 나온 수맥에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장마’ 중)
그가 자주 가는 태백에서 썼다. “태백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게는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누군가 보고 싶어진다. 떠나온 곳이 그리워진다. 그 그리움을 쓴 시다. 함께 장마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다가오는 시간에 그 장마를 같이 보고 싶다는 얘기다. 당신이 그립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 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다.”
박준의 시에는 ‘당신’이나 ‘미인’이 자주 등장한다. ‘미인’은 누구일까. “20대 초중반 권정생 선생님의 글을 많이 읽었다. 권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권 선생님이 교회 종지기를 하면서 살던 집 툇마루에서 쓴 시도 있다. 물론 미인은 내게 일찍 사고로 숨진 누나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
그 시가 그리움의 정조를 일으키는 이유일까. 첫 시집에는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해남으로 보내는 편지’와 같이 ‘나’의 정서적 허기를 채워주는 시들이 여럿이었다. 이번 시집에는 ‘쑥국’ ‘삼월의 나무’ ‘좋은 세상’ 등과 같이 ‘당신’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시가 많다. 쉬운 우리말로 위로하는 말품이 다정하다.
박준은 시인 말고 다른 누군가가 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시인이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한다. 아마 시인이 아니라면 트럭 운전사가 됐을 것 같다. 사실 트레일러 면허를 따려는 참에 등단을 하게 돼 여기까지 왔다”며 웃었다. 현재 그는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시를 쓴다. 그가 그때 등단하지 않았다면 트럭을 운전하는 시인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의 부친은 트럭 운전사로 일했다. 그의 아버지는 시가 될 말을 툭툭 뱉는 사람이다. ‘비 온다니 꽃 지겠다// 진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생활과 예보’ 전문) 아버지가 실제로 한 말을 시로 쓴 것이다. 그 아버지는 불현듯 시인의 집을 방문하곤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하며 엉엉 우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시작노트에 뭔가 써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시집 많이 팔면 돈을 부치라”며 은행 계좌 번호를 적어주는 분이라고 한다. 시인의 유전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을지 모른다.
어떤 시인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시와 시인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둘 사이에 교집합이 넓다고 생각한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어떤 시를 쓰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좋은 삶이 좋은 시를 낳을 것이다. 왼발인 시가 먼저 가고 오른발인 삶이 뒤따라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간다”고 했다. 아름다운 삶과 시가 결국 짝이라는 얘기로 들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