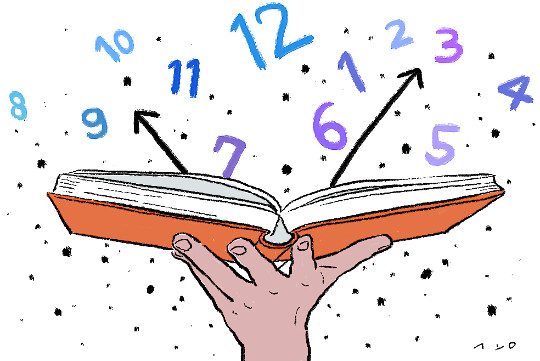

그 옛날 많은 여성들이 그랬듯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타고 남은 재에다가 ‘가’를 쓰고 ‘나’를 쓰면서 한글을 깨쳤다. 하지만 그 시절 여자가 글을 배우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기에 할머니는 오랫동안 까막눈 행세를 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시부모와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난 1987년부터. 할머니는 도라지를 내다판 돈으로 공책을 사서 그날그날의 일을 적어 내려갔다. 지난 8월 출간된 ‘아흔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할머니가 30년 넘게 써온 일기에서 인상적인 글을 추려 엮은 것이다. 강원도 양양 송천마을에 사는 할머니의 이름은 이옥남. 제목에 ‘아흔일곱’이 들어간 건 그가 올해 세는나이로 아흔일곱 살이 돼서다. 책에는 가슴이 뻐근해지는 짤막한 글이 차례로 등장한다.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막 차려서 먹으려 했는데 아들이 온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밥맛도 더욱 맛있게 먹었지. 자식이 무언지 같이 있는 기 좋고 맘도 흐뭇하고 즐겁다. 한 세상 살다보면 이럴 때도 있다 생각한다.”(1998년 4월 1일)
“소나무 가지에 뻐꾹새가 앉아서 운다.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힘들게 운다. 일하는 것만 힘든 줄 알았더니 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힘들게 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사는 것이 다 저렇게 힘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2006년 5월 19일)
“밭에서 김을 매는데 젊은 여자가 보건소에서 나왔다면서 치매 조사를 하고 갔다. 나 사는 동네 아냐고 해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라고 했더니 올해가 무슨 년이냐고 물어서 2014년이라고 대답했다. 오래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다.”(2014년 4월 11일)
온라인 서점에서 독자들의 서평을 보면 그야말로 호평 일색이다. 그의 맑은 글에서 뭉근한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할머니의 일기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선사하는 건 그의 글에 티끌만한 얼룩도 묻어있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글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엔간한 글에는 진실만큼이나 많은 거짓이 포개져 있는 법이니까. 자그마치 27년간 숲에 숨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미국인 크리스토퍼 나이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오랜 세월 은둔했지만 한 번도 일기를 쓴 적이 없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가 오거나 밤이 이슥해지면 한 번쯤은 객쩍은 감상에 젖어 아무 글이라도 끼적거릴 텐데 나이트는 아니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일기는 단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수많은 진실을 말하거나, 단 하나의 진실을 덮으려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가장 사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일기가 이럴진대 다른 글이야 오죽할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상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인간이 저지르는 그토록 깊고 넓은 거짓의 세계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이 있어서다.
가령 구글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뇌시경’ 역할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국내에 출간된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구글 검색 결과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일삼는 존재인지 선명하게 드러낸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미국의 인종주의가 결딴났다고 여겼다.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유권자는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점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량을 보면 이건 얼마간 거짓이었다. 당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보다는 ‘깜둥이 대통령’을 더 많이 검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은 그의 당선을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여겼지만 각종 빅데이터를 훑어서 보면 이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글이나 말은 이옥남 할머니의 일기장과는 다르다. 우린 무엇을 대하든 진실과 거짓이, 혹은 올바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충돌할 때 생겨나는 모순에 주목하면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은 산문집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첫머리에 ‘문학적 시간’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면서 이렇게 적었다. “평소에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모순에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순간을 나는 문학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 숫자가 차고 넘쳐서, 혹은 그 내용이 모자라고 너저분해서 별무소용의 존재가 돼버린 한국의 저널리즘에 가장 필요한 것 역시 바로 이 문학적 시간일 것이다.
박지훈 문화부 기자 lucidfal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