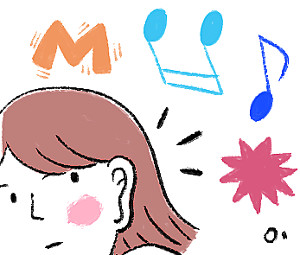
2166. 며칠 전 퇴근시간쯤 탔던 2호선 순환선 지하철 칸의 번호다. 휴대폰 배터리는 6%였고, 더 이상 음악을 들으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끊길 것 같아서 이어폰을 뺐다. 그리고 만원 지하철 안 사람들을 관찰했다. 나는 귓속으로 들어오는 소리만 달리 해줘도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을 수시로 이탈하는 좀 귀찮은 습관이 있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한다 말할 수 없고, 소음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음악이란 단지 음악가에 의해 정교하게 의도된 규칙을 가진 소음이라 생각하는 편이다.
손 선풍기를 들고 청반바지를 입고 있던 20대 여자. 내 옆에 기둥처럼 서 있던 키가 189㎝는 돼 보이던 30대 남자. 친구와 어딘가를 다녀오는 50대 여자 둘은 추운 지하철 칸 대비를 위해 얇은 머플러를 팔에 걸치고 있었다. 얇은 면바지에 피케셔츠를 입고 휴대폰 살 때 끼워주는 기본 이어폰을 귀에 꽂고 검은 백팩을 멘 40대 남자. 짧은 원피스를 입어 손수건으로 무릎을 덮고 앉아 졸고 있는 30대 여자. 모두들 어딘가를 가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귀가 중이었을 것이다. 나처럼. 나는 어깨 때문에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지날쯤이었다. 이때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한강을 지나다 다리가 무너지거나, 검은 터널 속에서 화재라도 난다면 다들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칸의 번호를 외우고 싶지 않았어도 외워야겠지. 나는 배터리가 끝나기 전에 내가 있는 칸을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꼭 잊지 말아야지. 나 없어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잘 키우라는 말과 함께.
이런 웃긴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역에 도착했다. 전철에서 내려 우리 동네가 가까워지니 매미가 신경질적으로 울었다. 도시의 저 매미는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 땅속에서 기다리다 이번 여름 첫 생을 사는 것이라는데. 저 처절한 매미는 올 여름 짝을 찾지 못하면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그것은 도시의 소음도, 구애의 음악도 아니었다.
글=유형진(시인), 삽화=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