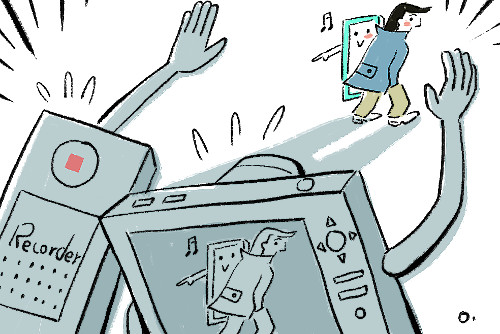

지난 5월 이사를 준비하면서 쓰지 않을 물건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졌다. 책상 서랍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하던 중 깊숙한 곳에서 구형 디지털카메라(디카)와 녹음기를 발견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난 옛 물건들을 보니 2010년 초의 설레던 감정이 떠올랐다. 당시 국민일보에 입사를 하자마자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봤다. ‘기자’ 하면 떠오르는 것은 펜과 수첩이지만 굳이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 물건이었다. 주변에 앞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디카와 녹음기가 있으면 좋다고 했다.
당장 지하철을 타고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로 갔다. 카메라에 대해 좀 아는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디카부터 샀다. 이어 다른 매장에서 소형 녹음기를 골랐다. 둘 다 한손에 꼭 들어오는 크기로 바지 주머니에도 쉽게 보관할 수 있었다. 양손에 각각 카메라와 녹음기를 쥐고 있으니 의욕이 차고 넘치며 벌써부터 훌륭한 기자가 된 양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사내교육을 마치고 수습기자로 현장에 투입되자 펜·수첩과 함께 디카와 녹음기가 꽤 유용했다. ‘어리바리’한 수습은 현장에서 뭘 보고 취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기록으로 남기는 데에도 서툴렀다. 이때 디카를 꺼내 사진을 찍어두고 나중에 확인하면 활자로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됐다. 눈으로는 놓친 중요한 ‘팩트’를 건질 수도 있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언제든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였다.
휴대전화에 촬영·녹음 기능이 없어 별도의 기기를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초창기 버전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화기의 기능을 믿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사진은 카메라로 찍어야 하고, 녹음은 녹음기로 해야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지’라는 인식이었다. 스마트폰이라고는 해도 통화와 문자메시지 외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내 취재 장비 중 가장 먼저 ‘퇴역’한 것은 녹음기였다. 급할 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몇 번 해보자 녹음기는 아예 필요 없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나마 디카는 최근까지도 썼다. 2015년 영국 출장을 갈 때 들고 가서 스마트폰 카메라와 번갈아가며 취재용 사진을 찍었다. 디카가 좀 더 넓은 장면을 담기는 했지만 화질은 스마트폰이 더 좋았다. 스마트폰에 비해 휴대성도 떨어졌다. 결국 디카도 이때 출장을 끝으로 전원이 켜지는 일은 없었다.
10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펜과 수첩도 이제는 거의 쓰지 않게 됐다. 검색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지만 요새는 한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획기적이었다. 지난해 한 친구가 무선 충전기를 쓰면 편리하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없어도 되는 사치품으로만 보였다. 그러다 폰을 바꾸면서 사은품으로 무선 충전기가 왔기에 써보기로 했다. 현재는 집에 두 대의 충전기를 놓고 쓰는 중이다. 폰을 거치해두기만 해도 바로 충전이 됐고, 충전기 선을 폰에 꽂았다 뽑았다 하는 수고가 사라졌다.
그러나 ‘신(新)문물’이 반드시 삶의 행복도를 올려주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바일 메신저다. 처음에는 상당히 편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체대화방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단체대화방은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대화방의 사람들은 내가 쉬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떠들어대듯이 메시지를 보낸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많은 기기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져가는 추세다. 사색에 잠긴다든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시간만 나면 폰을 들여다본다. 심지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 확인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폰을 켠다.
구글의 미래학자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 인류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영생을 갈구했던 인류는 종교를 통해 해법을 찾아왔지만, 그가 말하는 영생은 생물학적 개념이다. 인간의 면역체계를 대신할 나노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매년 늘어난다는 관측이다. 너무 오래 살아 지겨워지면 기억을 초기화할 수도 있다고 한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AI)이 2045년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분명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소름이 돋는 것도 사실이다.
글=유성열 산업부 기자 nukuva@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