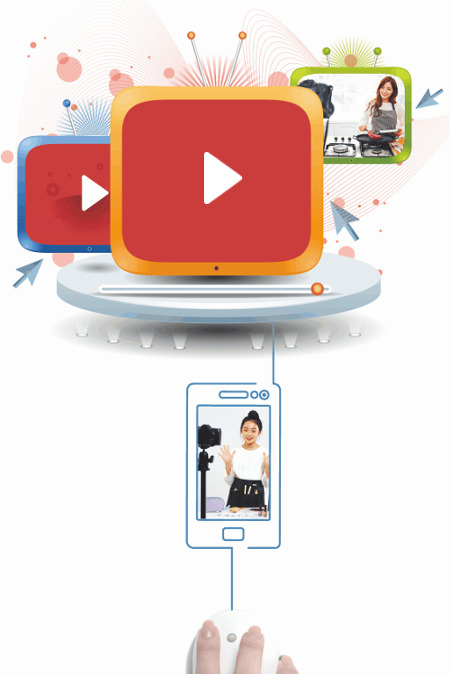



요즘 S씨는 한창 1960년대 ‘블루아이드소울’(Blue-Eyed-Soul·백인이 부르는 흑인영가)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CD 앨범도 아날로그 디스크도 MP3 음원도 사지 않는다. 근사한 오디오 세트도 없는 그가 이 음악을 듣는 방법은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서 검색 단어를 쳐 넣으면 된다.
크리스 팔로우라는 40년생 영국 가수가 부르는 ‘아웃오브타임(Out Of Time)’이란 노래를 백 번도 더 들었다. 66년 영국 독립음반제작사에서 발매된 싱글앨범인데 유튜브에는 팔로우의 공연실황 비디오와 함께 올라와 있었다. 유명한 록밴드 롤링스톤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노래다. 지금은 여든이 넘은 롤링스톤스 맴버들이 20대 청춘일 때 작곡했던 이 노래를 팔로우한테 줘서 앨범까지 제작해준 곡이다.
팔로우의 노래를 띄우면 유튜브 사이트 오른쪽엔 관련 음악이 죽 뜬다. ‘자동재생’을 누르면 50곡 이상의 비슷한 블루아이드소울, 60년대 음악들을 다 들을 수 있다. 게시자는 ‘classicperformance2’라는 아이디를 쓰는 60대 영국인 음악애호가다. 구독자가 8만6489명. 2017년 명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독일 바이에른 바바리안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5번 ‘황제’ 공연실황부터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5번, 그리고 다양한 로큰롤과 팝음악 등 수백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가득한 채널을 운영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사는 채널 가입자 1000명, 연간 4000시간 이상을 기록한 채널 운영자부터 수익금을 배분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classicperformance2’는 이 채널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커리어우먼 A씨의 취미생활은 혼자 요가 하기다. 퇴근하면 편한 트레이닝 복장으로 거실에 앉는다. 인터넷이 연결된 TV로 유튜브를 켜고 요가 배우기 콘텐츠를 검색해 운동을 해온 게 2년째다. “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도 요가 콘텐츠가 있긴 하죠. 근데 아주 불편하죠. 네이버TV 플레이어 다운받고 플러그인 다운받고…. 파일 용량도 엄청 커서 중간 중간 끊기고 그래서 집어치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급자가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콘텐츠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였어요.” A씨의 친구들 중엔 디자인 자수, 수채화·유화 그리기 등을 유튜브로 배우는 사람이 가득하단다.
유튜브의 경제학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인터넷이 일반화된 1990년대 말 등장한 신조어였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을 유목민에 빗댄 말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디지털 캐러밴’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남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엿보기’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생산해낸 콘텐츠를 전 세계인들이 즐기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디지털 캐러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사이트가 뭐냐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십중팔구 유튜브라고 답할지 모른다. 취미 삼아 업로드한 자신의 콘텐츠에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뉴질랜드인 아르헨티나인들이 댓글을 남기고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돈도 벌 수 있으니 그야말로 현대판 중동상인인 셈이다.
2005년 매우 사적인 생일축하파티 영상을 친구들과 아주 쉽게 공유하고 싶었던 미국 청년 3명이 만든 이 사이트는 처음부터 사용자 개방성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쉽게 자료를 올리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이듬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뒤에도 이 목표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인터넷 스팟광고가 콘텐츠 중간에 튀어나오고 돈벌이용 수익 모델을 만들어도 사용자 개방성은 죽지 않았다. 되레 구글은 거대자본을 투입해 유튜브의 개방성을 강화했다. 더 쉬운 방법의 업로드, 더 쉬운 방법의 멀티미디어 재생을 위해 돈을 썼다. 유튜브의 경제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사용자 크리에이터(Creator)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누구에 의해 생산됐는지, 내용이 뭔지, 인기가 있는지 등에 의해 크레이터와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특히 예민한 음원시장에 대해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임도 진다. 유튜브에 띄워진 음원은 앨범 제작사가 제작한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도 유튜브가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네티즌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회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더 편한 사용 환경과 개방성을 도모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수많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 언어로 콘텐츠 자막을 제공하는가 하면 최소 데이터와 최소 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고,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배출되며 이들이 올린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유통된다. 돈벌이를 추구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다양한 콘텐츠는 거대한 아카이브(Archive)를 형성하고, 네티즌들은 마치 도서관에 가는 것처럼 이를 검색하고 이용한다. 우리가 찾는 인터넷 사이트의 플랫폼 하나, 그리고 그 플랫폼을 만든 해당 기업만이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버린 것이다.
초라한 국내 음원 사이트
K씨는 국내 음원 사이트인 ‘벅스뮤직’을 17년째 유료로 이용해온 음악애호가다. 2001년 벅스뮤직이 론칭되자마자 가입해 올해 초까지 매달 거의 1만원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아했다. 그런데 지난 2월 벅스뮤직 유료 가입자를 탈퇴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더 이상 들을 만한 음악이 거긴 없어요. 있던 것들도 자꾸 없어지더라구요.”
좋아했던 곡들이 벅스뮤직 사이트에서 사라져간 것은 지적재산권 때문이다. ‘컬트(Cult)’적 기질을 가진 K씨의 음악 취향은 비(非)인기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기껏 찾아놨던 음악들도 다시 벅스뮤직에 들어가면 ‘카피라이트 문제로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다. “새로운 콘텐츠는 전부 아이돌 음악이나 인기가요들뿐이죠. 저처럼 새로운 음악,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찾는 사람들한테 벅스나 멜론은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있던 음원도 지적재산권 만료로 더 들을 수 없다니….” 그는 혀를 찼다.
벅스뮤직은 한때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의 파라다이스였다. 외국 어느 음원 사이트와 비교해도 음원들의 폭이 넓고 깊었다. 희귀 음원·음반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로 음원은 확장은커녕 수축일로였다. 3년·5년·10년 단위로 벅스뮤직 측이 확보했던 지적재산권이 속속 상실되자 운영사 측은 이를 다시 사들이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앨범’에 저장해뒀던 음원들을 듣지도 못하게 되기 일쑤였다. 아무리 항의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운영사가 직접 콘텐츠를 고르고 업로드하는 방식. 전형적인 사용자 폐쇄주의로 운영됐던 벅스뮤직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다. 후발주자인 멜론 역시 마찬가지다.
플랫폼으로 돈벌이만
네이버TV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창 유튜브가 인기를 끌자 독점적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측은 네이버TV를 만들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멀티미디어를 공유하겠다는 포부였지만 현재로선 단지 포부에 그치고 있다.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절반 이상이 TV 방송사들이 만든 콘텐츠다. 스포츠 중계, 드라마, 예능 쇼, K팝…. 일반 사용자가 올렸다는 각종 콘텐츠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돈벌이용이다.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콘텐츠 업로드로 사용자를 모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상업적 시도들이 가득하다. 업로드한 콘텐츠 관리도 해당 사용자가 아니라 네이버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삭제당하고, 검색 순위도 네이버가 결정한다. 콘텐츠를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플레이어도 불편하기 그지없다. 별도의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받고 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해야 한다.
네이버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다. 플랫폼을 개발하면 이를 이용해 이윤창출 극대화에만 올인하는 것 말이다. 네이버TV가 잘 되지 않아도 네이버 포털을 통해 방송사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사용자가 몰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를 인터넷으로 중계한다. 미약한 일반 크리에이터들은 네이버로선 여전히 불편한 존재일 뿐인 셈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