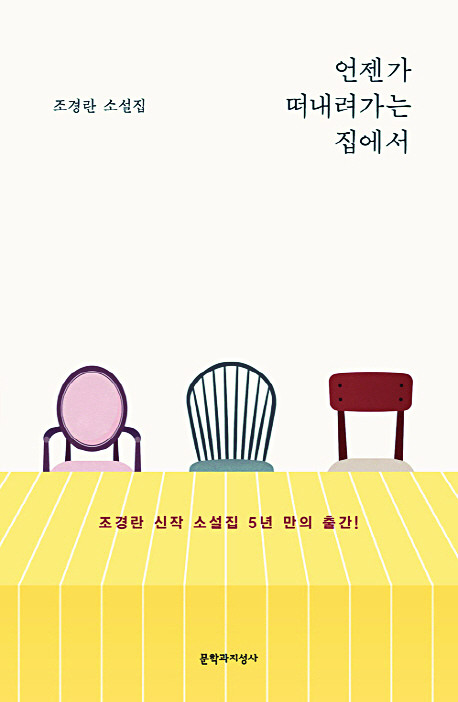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중견 소설가 조경란(49)이 ‘일요일의 철학’ 이후 5년 만에 내는 소설집 ‘언젠가 떠내려가는 집에서’엔 이런 이야기 8편이 실렸다. 낯선 이들이 한집에 살면서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 사람 사이의 작은 변화가 공동체에 일으키는 파장, 매일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말 등에 대한 다사로운 성찰이 담겼다.
표제작은 양아버지와 메마른 삶을 살아오던 서른일곱 살 남자 인수가 새로 온 가사도우미 경아와 지내며 가족을 이뤄가는 이야기다. 일하러 온 첫날, 경아는 생닭을 손질한다. 어쩔 줄 모르는 인수에게 “아저씨, 도와주실 거죠?”라고 느릿느릿하게 말을 건넨다. 단골 병원 원무과 직원에 이어 시체보관소 실무자에게까지 정기적으로 봉투를 건네는 아버지. 인수는 아버지의 그런 행태가 어딘지 못마땅하고 허탈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데가 조금씩은 다 있지 않냐”는 경아의 한마디에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툭 열린다.
인수는 오랫동안 동네 교회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자기 출생과 관련 있을 거라 짐작하며 그 주변으로 산책을 다니곤 한다. 베이비박스는 사람들이 몰래 아기를 유기하는 곳이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던 인수는 경아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TV 일기예보에서 태풍에 집이 둥둥 떠내려가는 장면을 보던 날. 서너 살짜리 아이를 포함해 아슬아슬하게 지붕 위에 있던 세 사람이 구조를 기다린다. 인수는 구조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경아는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라고 인수에게 묻는다. 그렇게 그 집에 머무는 세 사람의 모습은 조금씩 아늑해진다.
‘11월 30일’은 가족의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진 청년 훈이 광장의 집회 인파에 뒤섞이게 되는 이야기다.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흘러들어가 뭔가를 하며 오늘도 살고 있다. 작가가 2016년 촛불 집회의 기억을 어느 저녁 어스름에 달걀 한 판을 들고 골목을 오르던 한 청년의 뒷모습과 연결한 작품이다.
이 단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들의 의미를 조용하게 묻는다. 조경란은 ‘작가의 말’에서 “모르는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끼리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단편들을 모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삶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다. 그런 생각으로 천천히 오래 쓴 이야기들이라고 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