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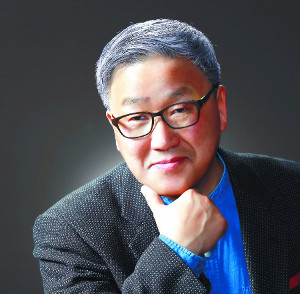
인간은 원래 혼자다.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고독은 인간에게 구원과 애정을 갈구하게 만드는 원초적 감정이다. 외로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침잠해 있는 감정들을 휘저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 아직 그 누구도 외로움을 그처럼 3차원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자코메티의 대표작 중 하나인 ‘걸어가는 사람’을 보자. 모든 것을 벗어버린 채 홀로 걷는다. 단단하게 꼿꼿이.
이 작품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우주의 무수한 입자들이 달라붙은 듯한 그의 몸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 그렇게 빈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입자들이 응축돼 있는 입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머나먼 끝, 수십억년 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작품들이 예외 없이 살아 있는 눈빛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겸허하고 당당하다. 자코메티의 작품이 보여주는 결연히 도전하는 모습들은 허무주의로의 퇴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의 작품들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관계성에 대한 애착이다. 자코메티의 인물들은 비례가 과장돼 표현돼 있으나 밤새 어둠을 태우고 흘러내린 용암처럼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팔과 다리가 보여주는 세세한 몸짓과 강한 눈빛 역시 관계성 구축을 위한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코메티의 조각은 외롭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다.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코메티가 대가로 여겨지는 것은 그의 작업이 종말을 초월해 ‘삶의 승화’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작가로서의 궤적은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자코메티는 모든 화가나 조각가가 결코 모두 예술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작가였다. 그의 작업은 정신적으로는 초현실주의, 표현에 있어서는 미니멀리즘, 기교적인 면에서는 무기교와 닿아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그는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예술가였다. 그의 조각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페인팅과 드로잉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드로잉의 강렬함은 그의 작업들이 무의식 속 ‘초감각’이 주도해 진행됐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의 손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그어진 선들은 극도의 감각적인 제스처다.
그의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미완성의 미학이다. 그의 작품은 ‘미완성의 여지’를 품고 있다. 자코메티가 만든 작품들은 우리들의 시각과 감성과 기억과 경험과 상처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들의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온다. 정신의 뿌리를 겨냥한 그의 메시지는 원초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정신세계와 쉽게 조우한다.
그의 선택적 미완성은 완결에서 오는 편안함을 주진 못하지만 작품과 관람자를 긴장 속에 깨어 있게 한다. 이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충동하여 완결에 대한 상상을 부추긴다. 다분히 의도적인 이러한 시도는 완결되기를 거부하고 수많은 가능성을 끌어안은 채 관람자들을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게 만든다. 이는 세잔이 그의 후기 수채화에서 보여주듯이 작업의 완결이 이미지의 완성에서가 아니라 요소들의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완결된다는 차원 높은 미학을 보여준다. 오늘도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이 우리들 삶에 자리를 펴고 눕는다. 이 와중에 자코메티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간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손님과 같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해 본질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최두남 명예교수(서울대 건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