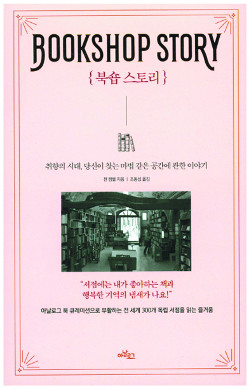
스코틀랜드 해안 인구 1000명 안팎의 작은 도시 위그타운. 1970년대에 이곳에서 보석상을 하던 존 카터는 도난사고로 보석이 모두 털리자 아예 업종을 전환했다. 책을 팔기로 한 것이다. 30년 동안 서점의 규모는 점점 커졌다. 고무된 주민들은 도시 전체를 스코틀랜드 공식 책의 도시로 만드는 일에 도전했다. 서점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각지에서 서점들이 옮겨 왔고, 창고나 가정집에도 서점이 문을 열었다.
출판업이 사양길인데 서점이 의미가 있을까. 영국 런던의 고서점에서 일하며 저술활동을 하는 저자가 전 세계 6대륙에 걸쳐 300여곳 서점을 둘러본 뒤, 이 회의적인 질문에 내놓은 고무적인 답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독립서점들이 이처럼 도시의 고용 창출에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미국 덴버의 서점 ‘태터드 커버 북스토어’는 8년 만에 7배나 성장했고, 처음 2명이던 직원이 150명으로 늘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은 책을 매우 좋아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읽히고 싶은 서점 주인들의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 작가조합이 주는 상도 받은 태터드 커버는 1년에 500∼600가지 행사를 한다. 저자 초청행사에는 J.K. 롤링을 비롯해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왔다. 시카고의 ‘파월스’는 책장에 하드커버, 신간, 중고서적을 한데 섞어 진열했는데 이게 논란을 일으키며 대성공을 거뒀다.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는 작가들이 서점에서 묵을 수 있도록 책장 사이에 침대 13개를 숨겨 놓았다. 그리하여 작가들의 구심점이 된 이곳은 관광 가이드북에 오를 정도다.
지역과 역사가 다르니 서점의 기능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 알래스카의 ‘올드 인렛 북숍’은 서점 옆 야외 욕조에 몸을 담그고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상점도 함께 운영한다. 탄자니아의 ‘TPH 북숍’은 진보적 사고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회운동의 거점이다.
이런 모든 차이를 관통하는 한 마디는 책에 대한 깊은 애정이다. ‘나는 책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서점이 중요한 이유는 책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값진 경험이다’ ‘책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서점을 예찬하는 문장들이 책갈피마다 튀어나와 은퇴 후 서점을 차릴까 하는 욕망을 충동질한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