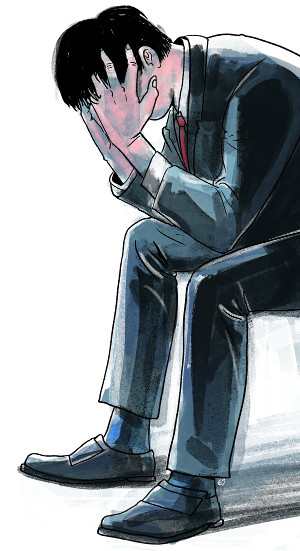

‘취업의 겨울’은 불황과 함께 찾아온다. 우리 사회의 만성질환이 된 청년실업도 외환위기에 뿌리를 둔다. 그 뒤로 숱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무엇 하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정부가 숫자에 매달리는 동안 청년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다. 어느새 청년실업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진다.
실업의 시대
신문에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던 1999년이었다. 외환위기로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대학가에 위기감이 번졌다. 통상 채용 주기에 따라 실업률이 가장 낮은 3분기에도 만 20∼29세 실업률이 9.5%에 육박했다. 고도성장으로 사실상 완전고용을 유지해 왔던 우리 사회에 낯선 현상이었다.
경기 침체는 정부의 선택지를 좁혔다. 일자리 문제보다 외환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내수 중심의 ‘대중경제론’을 외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30%가 희생해 70%를 살리자”며 대기업 살리기용 정리해고를 합법화했다. 있던 사람도 쫓겨나는 판에 갓 사회로 나온 청년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리 만무했다. 실업자가 많아지니 자연스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최초로 실업자 유형을 지역, 연령 등으로 나눴다. 이른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집중 추진하던 공공부문 정보화 산업 인력의 30%가 청년으로 채워졌다. 기업에 정부 지원 인턴사원제가 확산됐다. 정부 지원 취업정보 포털 워크넷이 만들어졌고,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했다. 취업 지원책은 힘을 발휘했다. 청년실업 지표를 낮췄다. 다만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나빠졌다.
‘고용 없는 성장’의 수렁
낮아지나 싶던 청년실업률은 노무현정부 출발과 함께 다시 뛰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이유였다. 경제 성장의 속도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졸자가 급격히 늘면서 고학력자는 많아졌지만 취업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높아진 기대임금 탓에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게 당연시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는 고용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 맞춤형 취업 정보를 다양하고 실속 있게 제공하면 실업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그렇지만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인 고용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개정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되레 문제를 대폭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년실업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더 나빠졌다. 이명박정부는 고졸자 취업을 적극 장려했다. 대졸자에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해외 취업 기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저질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심화됐다.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단적인 예였다.
‘숫자 채우기’에 매달린 정부
박근혜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숫자에 매달렸다. ‘고용률 70%’ 달성을 기치로 내건 데서 알 수 있듯 일자리 양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였다. 방법은 고용 유연화였다.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동 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허울뿐이었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만들겠다고 제시했던 일자리 20만개 가운데 12만5000개는 인턴과 직업훈련이었다. 나머지 7만5000개 중에서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령자 일자리 대체가 5만3000개나 됐다. 고령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청년으로 채우겠다는 식이다.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20∼29세 실업률은 11%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양(量)보다 질(質)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한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26일 “2년 이상 근무하면 개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재 제도를 특정 일자리가 2년 연속 비정규직으로 운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에 주목하라는 취지다. 하 교수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혁해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주거·학비 등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취업과 생활에 맞춰진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비·학비를 지원하거나 불가피하게 진 부채를 부분 탕감해주는 등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는 정책이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조효석 홍석호 안규영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이은지 안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