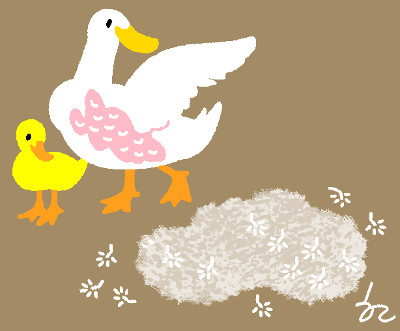
다운(down)은 새의 솜털 혹은 잔털을 뜻한다. 빳빳한 깃털(feather)이 보호용이라면 그 안쪽에 돋아나 있는 다운은 보온용이다. 깃털이 없이 태어나는 새끼도 다운은 덮여 있다.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맞닥뜨릴 찬 공기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이 털이 필요해서인 듯하다. 다운의 보온 효과는 수많은 가닥이 서로 엉킨 클러스터 형태에서 비롯된다. 털뭉치 틈새마다 공기층이 형성돼 열의 방출을 막아준다. 오리털(duck down) 패딩의 품질 지표인 ‘필 파워’는 다운 1온스를 압축했다가 풀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복원력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기를 많이 품고 있다는, 그래서 보온 효과가 높다는 뜻이다.
솜보다 오리털이, 오리털보다 거위털이 많은 공기를 품는다. 거위털이 더 따뜻할 텐데 오리털 패딩이 훨씬 보편화된 것은 사람들이 거위보다 오리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새의 다운은 피부에 촘촘히 박힌 미세한 털이어서 양털처럼 이발하듯 깎아낼 수 없다. 새를 죽여야 한다. 도축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털이 우리가 입는 패딩에 충전재로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세계 오리털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것도 오리고기 소비량이 월등히 많아서 그렇다. 201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돼 중국이 가금류 시장을 폐쇄했을 때는 오리털 가격이 70%나 폭등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반도체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곳곳에 균열이 생겼는데, 오리털에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에 20달러쯤 하던 가격이 올해는 40달러를 넘어섰다. 요소수 품귀 사태처럼 오리털 수급 불안도 중국발(發) 현상이다. 중국인의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가금류 소비가 줄었고, 전력난과 환경규제에 오리털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원자재 값이 폭등한 만큼 패딩 값도 오르게 될 텐데, 이런 공급난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충분한 보온 효과를 내는 친환경 충전재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런 ‘비건 패딩’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이참에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태원준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