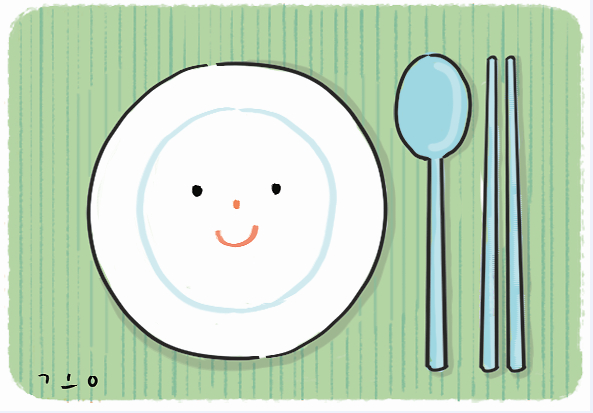
2018년부터 육식을 제한하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는 중이다. 그중 사소한 일 하나는 유독 뭔가 먹는 꿈을 폭발적으로 자주 꾼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 요리다. 이제는 고기를 먹지 않는 생활에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 무의식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그저께는 곱창을 구워 먹는 꿈을 꾸었고, 그 전날에는 햄을 기름에 지글지글 굽는 꿈을 꾸다 깨서 침대에 누운 채 햄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먹는 것보다도 그 음식 자체에 얽힌 기억이 더 맛있을 때가 있다. 햄이 그렇다. 나는 유치원에 다닐 때 햄을 처음 먹어 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짝꿍 덕이었다. 분홍색을 띠는 동그란 소시지만 알던 나는 그날 짝꿍의 도시락 속 햄을 먹고 파격적인 맛있음에 황홀경을 느낄 지경이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햄을 도시락 반찬으로 싸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햄’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해 ‘스피드 퀴즈’ 식으로 햄을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
소시지인데 사각형이고 테두리가 진한 거, 그걸 도시락으로 싸 달라고 조르던 어린 시절 내가 햄을 떠올릴 때마다 늘 생각난다. 엄마는 끝까지 내 설명을 알아듣지 못했다. 짝꿍도 맛있게 먹을 줄이나 알았지 그걸 햄이라고 부르는 줄 몰랐던 건 피차 마찬가지여서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 엄마가 싸주는 햄을 먹을 순 없었다. 햄의 추억은 그나마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인상 깊은 기억만 날 뿐 설명이 불가능한 음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의 양파 볶는 냄새, 우연히 한 음식점에서 먹은 김치, 어떤 옛날의 호프집 안주…. 그때마다 훅 끼치는 강렬한 기시감 속에서 내가 ‘어, 이 맛, 이 분위기, 분명히 내가 경험한 건데’ 하고 당황하는 사이 막간의 인상은 홀연히 사라지고 만다.
요조 가수·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