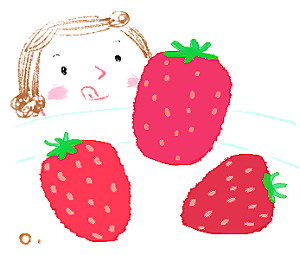
퇴근하는 남편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기를 세 팩이나 사왔다. 웬 딸기를 이렇게 많이 샀느냐고 묻자 세 팩을 묶어 할인해서 팔기에 사왔다는 알뜰주부 같은 대답. 이제 곧 하우스 딸기의 끝물인 것이다. 딸기를 씻으려고 보니 윗줄은 싱싱했었는데 아랫줄은 상한 것이 많았다. 상한 것을 도려내 다듬어 접시에 딸기를 올려 본다. 상한 딸기를 다듬고 나면 손에서 한동안 상큼한 딸기 향이 난다. 딸기 향을 맡으면 자동으로 어릴 적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
어릴 때 우리 집도 딸기 밭이 있었다. 수확해서 팔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부모님은 사남매 먹일 정도로만 하셨다. 큰 집 딸기 밭은 우리 밭보다 넓어서 밖에 내다 팔기도 하셨기 때문에, 딸기를 딸 시절이 되면 부모님이 가셔서 큰아버지 큰엄마와 함께 딸기를 따셨다. 나는 어쩐 일인지 우리 딸기보다 큰 집 딸기가 맛있었다. 큰 집 딸기 밭엔 벌도 많았다. 어른들이 딸기를 딸 때, 어린 우리가 밭에서 갓 딴 딸기를 먹으려고 서성거리면 벌에 쏘인다고 아이들을 쫓아내곤 하셨다. 벌에 쏘일 각오를 하고, 어른들에게 먹을 지청구를 각오를 하고 사촌언니와 딸기 밭에 몰래 들어가 따먹던 딸기의 달콤함을 생각하면 위 칸만 멀쩡하고 아래 칸은 헐은 요즘 하우스 딸기의 달콤함은 뭔가 허전한 달콤함이다.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딸기란 ‘봄의 무르익음’이었다. 그리고 딸기가 맛없어지면 곧 여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하우스 딸기 덕분에 마트에 딸기가 등장하면 ‘아, 곧 크리스마스겠구나’ 알게 된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세 팩 묶어 세일하는 딸기를 사오게 되면 ‘곧 봄이 끝나겠구나’를 알려주는 과일이 되었다. 하지만 곧 진짜 딸기의 계절이 온다. 하우스에서 자란 딸기가 아닌 겨울을 견딘 노지에서 자란 딸기를 먹으면서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달고 시고 부드러운 게 있었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시나브로 접하지 못하다가 다시 접하며 새로이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살아 있다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글=유형진(시인), 삽화=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