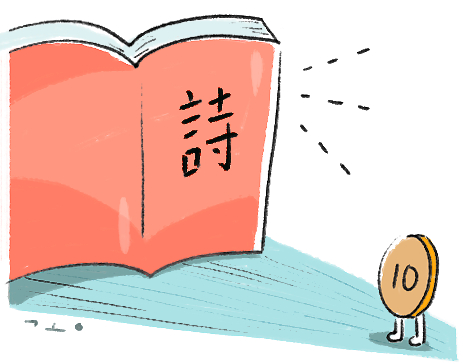
북카페에서 열리는 시 낭독회에 초대받았다. 낭독회 제목은 ‘쓰레기 낭독회’였다. 재미있게도 낭독회 입장료는 ‘손바닥만 한 작은 쓰레기’라고 했다. 정작 쓰레기를 고르려니 무얼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였다.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과 껌 종이가 보였다.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는 중에 또 다른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약국에서 지어온 감기약이었다. 감기가 다 나았으므로 그것 역시 버려야 할 쓰레기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도, 한쪽만 남은 귀고리도 모두 쓰레기라고 할 수 있었다. 사놓고 입지 않은 옷도, 2년간 딱 한 번 바른 립스틱도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쓰레기였다.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구겨 신은 다음 집 밖으로 나섰다.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고 집 앞 전봇대에 오른손을 대고 왼쪽 다리를 뒤로 들어 구겨 신은 신발 뒤축을 매만지는데 바닥에 떨어진 십 원짜리 동전이 보였다. 사실 어제도 그 동전을 봤다. 그때는 두 개였는데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누군가 다른 하나를 집어 갔다기보다는 바람에 의해 동전이 다른 곳으로 휩쓸려 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동전을 주웠다. 낭독회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동전을 줍지 않았을 것이다. 쓰레기 낭독회의 입장료로 이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십 원짜리 동전은 분명 십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지만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골칫거리였다. 자판기에도 이 동전은 넣을 수 없었고 슈퍼 같은 데서 사용하기에도 눈치가 보였다. 며칠 전 슈퍼에서 구입한 물건을 카드로 계산한 다음 비닐봉지값만 따로 십 원짜리로 건넸는데 슈퍼 주인은 십 원짜리를 줄 거면 봉투를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
낭독회 참석자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다양했다. USB, 인공눈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사탕, 요구르트가 담겼던 용기…. 모두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리기 전까지는 쓰레기가 아닌,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시의 의미도, 시를 읽는 즐거움도 모르는 사람에겐 시도 쓰레기에 불과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결국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의경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