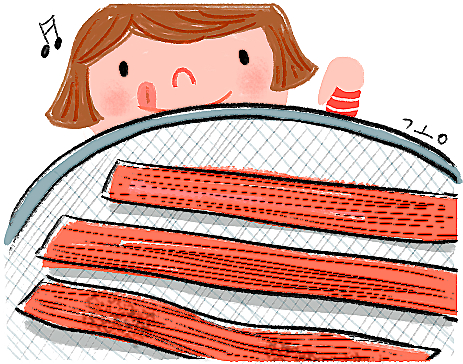
국민학생이었을 때 교문 근처 좌판에서 간식거리를 팔던 할머니가 있었다. 어른들이 먹지 말라는 불량식품이었다.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데 배앓이를 했다는 친구는 보지 못했다. 교문을 나서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좌판으로 몰려갔다. 이가 듬성듬성 빠진 할머니가 새는 소리로 “뭐 줄까?” 물으면 “쫀드기요! 쥐포요!”라고 두서없이 주문했다. 와글와글 시끄러워도 할머니는 용케 알아들었고 헷갈리는 법도 없었다. 나는 쫀드기와 쥐포가 몸을 뒤틀며 구워지는 동안 연탄불 옆에 쪼그려 앉아 얼른 먹고 싶어 조바심치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 잘 팔리니 할머니는 곧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중학교에 입학한 뒤 우연히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붙박이 장롱처럼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이 좌판 앞에서 어슬렁거리다 눈길만 주고는 그냥 지나갔다. 인기가 예전만 못해 보였다. 할머니는 한여름 땡볕에 달궈진 땅과 연탄불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부채 하나로 해결하고 있었다. 못 본 새 허리가 새우처럼 굽어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모습이 폭삭 짜부라질 듯 위태롭게 보였다. 사회 구조에 무지하던 철부지였지만 나는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 퍼즐처럼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얼마 전 동네 극장 앞에 추억의 먹을거리를 파는 트럭이 생겼다. 쫀드기와 어포, 잘근잘근 씹으면 단맛이 나는 아폴로 등이 트럭 짐칸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근사한 포장을 새옷처럼 걸친 그것들은 이제 먼지와 뙤약볕에서 자유로워 보였다. 옛 생각에 몇 개 고르려는데 길 건너에서 상추를 파는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신문지에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상추는 손님의 눈길을 끌기에는 너무 시들거렸다. 나는 쫀드기 대신 상추를 한 봉지 샀다. 할머니가 마수걸이라며 식구가 적어 조금만 달라 손사래 쳐도 비닐봉투가 미어지도록 넣어줬다. “상추쌈도 해묵고 국도 끓여 묵고 하면 금방 없어져.” 오월의 볕이 한여름 못지않게 따갑다. 만약 쫀드기 할머니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예쁜 포장에 담긴 쫀드기만큼이라도 나은 처지가 되었을까. 땡볕 아래 그늘 한 자락의 호사라도 누리게 되었을까.
최주혜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