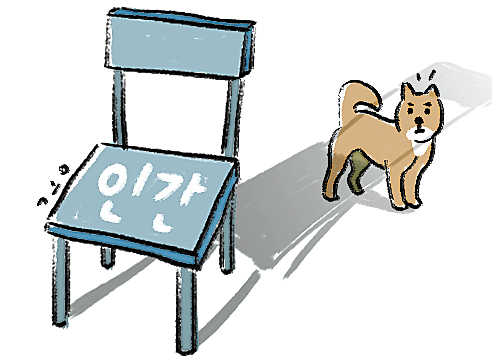
우리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유하고 처신하는 요령을 터득한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다. 사회화는 앞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제 한 인간의 생존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 사회의 원리에 수용됨으로써 자연으로서의 한 인간은 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며 나아가 국민이 된다.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그 사회의 이상과 그의 삶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초원에 사는 이가 철 따라 양 떼를 모는 것처럼, 북극해 연안의 부족들이 얼음을 쪼아 집을 짓는 것처럼, 그가 속한 곳의 성격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습성에 대해서라면 우리에게도 할 말이 좀 있다. 비리조차 능력의 한 부분으로 쳐주어서 생긴 일들을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으니 말이다. 당연히 사회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불합리한 일 앞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잡음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는 주변의 인정을 사고 도통 다칠 일이 없다. 사회성이 꽝이라면 정반대의 일을 벌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부조리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홀로 궁지에 몰리거나 크게 다치기도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멸을 삶의 조건으로 수긍하고 누군가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데 능숙하다. 도리어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약육강식의 동물성을 사회로부터 배운다고 해야 할까. 돈과 권력이 법과 윤리보다 두려우니 꼭 틀린 말도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윤지오씨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 아닌 것이 가져가더라도, 거기 남아 기어이 인간을 증명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회가 누군가의 삶을 포섭할 때, 말하자면 인간이 가진 내용 전부가 폭력적인 현실에 장악당하더라도 끝내 지울 수 없는 인간의 윤곽이 있을 것이다. 캄캄한 밤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는 몸의 경계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의 간절함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반경 같은 것 말이다. 불합리한 세계와 인간의 기원 사이에서 얇은 막처럼 떨리며, 텅 빈 인간을 채워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고독과 쓸쓸함과 서러움과 분노. 너무 슬프고 아파서 인간 자체인 인간의 순간을 그가 증명하고 있었다.
신용목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