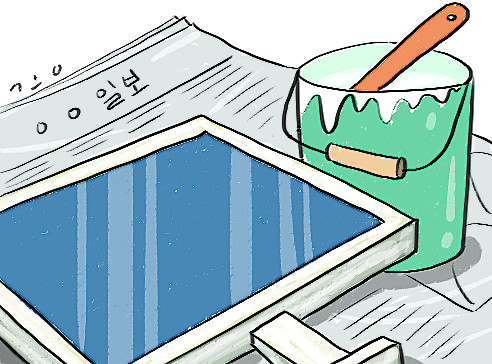
글을 쓰려고 앉았다. 새해 다짐이 그새 느슨해진 탓도 있겠지만 원래 게으름에 대해서라면 나는 장인에 속한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많았다. 그때, 늘 그 자리에 있던 맞은편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는 책장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다른 곳으로 치워야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침대 옆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이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침대의 방향을 바꾸었다. 역시 먼지는 숨바꼭질의 대마왕이다. 뒤늦게 술래를 부지런하게 만든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다. 이제 책장만 옮기면 된다. 하지만 거기 잔뜩 꽂힌 책을 뺐다가 다시 꽂는 일도 만만찮아서 그새 오전이 다 가버렸다.
다시 글을 쓰려고 앉았다. 책장이 있던 자리가 텅 비자 왠지 집이 불안정해 보였다. 공간의 균형을 맞추려면 적당한 무언가가 거기 있어야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작은 오디오가 그 자리에서 음악만큼 평화롭게 놓여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협탁을 가져다 놓고 오디오를 올렸다. 전원을 끌어올 멀티탭이 필요했고 세 블록 떨어진 전파사엘 다녀왔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니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문지 위에 흰색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한 걸까. 결국 나는 한 자도 쓰지 못했다. 물론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책장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핑곗거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글을 쓸 수 없는 이유. 내일이나 모레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일을 놓고 있는 자괴감과 자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 같은 것 말이다. 괴짜의 궤변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없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인지 하며 자신을 괴롭힐 수는 없지 않은가. 사실은 그래서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았다. 다행이었다. 누군가 모니터에 페인트칠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한 게 있는 걸 보니, 꼭 나만 나처럼 구는 건 아니었다.
신용목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