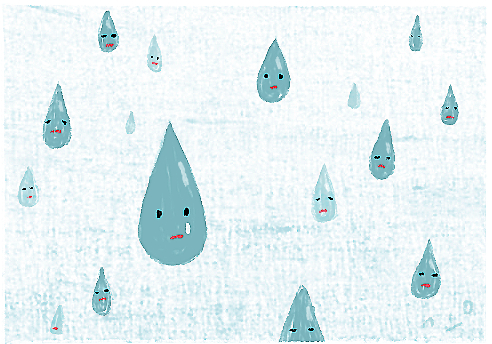
7년간 같은 병원에 있었고 25편의 논문을 함께 쓴 교수님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던 장소에서 황망하게 세상을 뜨신지 이제 열흘이 되었다. 그분이 돌아가신 과정을 들으며, 열 군데 칼을 맞은 스승의 굳어가는 얼굴을 보며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던 레지던트 후배를 보며, 예전과는 달리 어떤 평범하지 않은 세계로 건너간 듯한 은사님들의 표정을 보며, 각자의 삶에 애써 묻어 놨던 예전 트라우마들까지 한꺼번에 살아나는 참 힘든 한 주였다.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와는 다른 분노와 죄책감, 안타까움, 걱정이 몰려왔다.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나를 걱정하거나 위로해 주고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가셨다. “혹시나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이 너무 마음 아팠다. 나는 이 사건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일이라고 규정짓지 말자고 우리 환자들에게 말씀드렸다. 만약 주변에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는 뉴스를 본다고 해서 집집마다 부모와 자식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어색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열심히 치료받으러 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생각해보자고 했다. 굳이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어야 한다면, 꼭 그래야 한다면, 병이 있어도 치료받지 않는 사람과 정신과 치료경력에 대해서 손해를 주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쪽에 그 낙인을 돌리는 것이 옳다.
그날 이후 악몽, 불안, 분노를 넘어 피해망상까지 생기던 나도 병원을 찾았다. 환자들에게는 약을 잘도 처방하면서 막상 의사 본인은 술로 슬픔을 달래던데 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약을 처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았다. 돌아가신 분과 관련 없는 치료자를 찾아서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환자의 자리에 앉으니 나를 오히려 걱정하던 내 환자분들의 마음이 떠올라서 감사했다.백번을 환자의 자리에 앉아보더라도 치료자를 칼로 찌른 사람의 마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하주원 의사·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