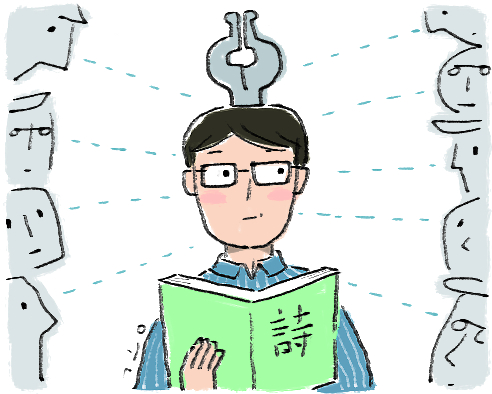
연말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오남매 중 나를 제외한 모두가 결혼한 데다 조카까지 두셋씩 두었으니 스무 명가량 되는 대식구였다. 하지만 경상도 집안의 무뚝뚝함은 인원수와 상관없는 것.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간혹 술잔 부딪치는 소리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다감하고 자상한 둘째 형이 있었다. 둘째 형은 서먹한 침묵을 화목한 대화로 돌려놓기 위해 애썼다. 하나하나 건강과 사업과 주변에 대해 차례차례 묻다가 마지막 차례로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에게 물을 말은 뻔했다. 문학이 가진 안팎의 어려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후 근황을 묻는 것이었다. 형의 자상한 노력에 맞춰 나도 뭔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싶었다. 사실 마음속으로 궁리까지 다 했다.
대충 이렇게 말할 요량이었는데, 최근 어떤 책을 읽었으며 그 책의 어떤 대목이 우리 가족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책의 결말처럼 온 가족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런데 불쑥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갸는 글 쓴다 카더마는 넋 나간 사람맹키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 고마.”
가족들은 힐끗,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거나 피식, 웃으며 모른 척 식사에 열중했다. 어머니도 무심하게 숟가락을 드셨고 그날의 MC 둘째 형도 잠시 두리번거리다 말을 돌렸다. 딱히 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딴에는 시집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남들 보기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시라는 게 끊임없이 자판을 두드리거나 쉴 새 없이 원고지를 구겨 던져야 하는 장르는 아니지 않은가. 훗날 소설 쓰는 원종국 형은 ‘택시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고 다닐 때만 일하는 건 아니다’라는 명언으로 나를 위로해주기도 했다.
우리는 실업의 상태나 쉬는 순간을 그저 낭비되는 ‘죽은 시간’으로 무의미하게 취급하곤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나를 위해 채워지는 시간이고 예술적·사회적·정치적 조건들이 생산되는 ‘살아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용목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