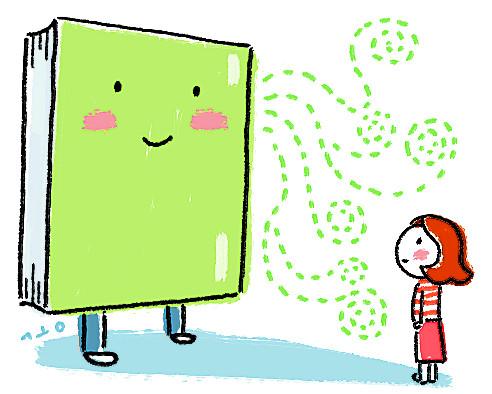
취미를 물으면 어린 시절부터 늘 대답은 같았다. 독서와 글쓰기. 어느 시절에는 시만 읽다가 또 다른 시절에는 과학 소설이나 에세이에 빠졌다. 애들이 좀 자라서 전보다 시간이 나자 작년부터 독서모임을 시작한 것도 생활의 활력이 되었고 큰 도움을 받았다. 책을 사랑하다 보면 책도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나 보다. 몇 달 전부터 바쁜 일상에 책을 읽지 못하고 잠들게 되면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늘 하는 일인 진료나 집안일이 바쁠 때도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안 읽으면 뭔가 제대로 살지 않은 것만 같았다.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이 의무가 되면 어느새 무거워진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것보다 없을 때 괴롭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달간 책을 멀리 해보기로 했다. 책을 읽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1년에 책 한 권 안 읽어도 잘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빌려 온 책도 싹 반납을 하고, 생전 안 보던 막장드라마도 보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고, 운동을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평화를 오히려 책을 읽지 않는 기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고, 읽어야만 한다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보다도 내가 처음부터 읽고 싶은 책에서 실용적인 도움마저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취미를 묻는다면 독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책에 치이면 어느 순간 책을 끊고 다른 재미를 찾아볼 것이다. 뇌의 여러 영역을 사용하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같은 자극이 반복될 때 뇌는 지친다는 원리를 왜 스스로의 실생활에서는 잊었을까. 이제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진작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했다. 비슷한 종류의 한 가지 취미가 아니라 뇌의 전혀 다른 부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사람은 자기 기질에 맞는 취미로 그럭저럭 돌아오게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돌아오지 않으면 또 어떤가.
하주원 의사·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