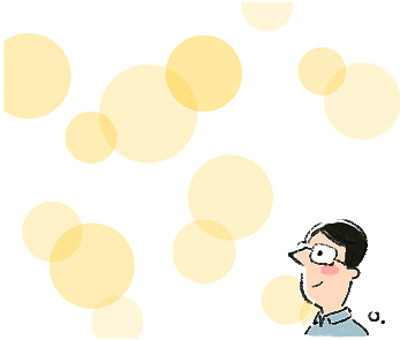
나는 종교가 없다. 호기심 많은 이들의 성장기가 대개 그렇듯 예배당이나 포교당 같은 곳에 다닌 적이 있지만 ‘믿음’을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스로 당혹스러운 것은 그렇다고 무신론자라고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자주 신을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나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일들이 숨겨놓은 필연성을 따져보곤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일의 전후가 가진 인과성보다는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져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 때로는 무의식을 추궁해본 적도 있고 세상의 우연과 복잡한 메커니즘에 기대본 적도 있지만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순간들이 일상 속에는 흔했다. 물론 특정한 대상으로서의 신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이유들이 또한 신의 순간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믿는 상태’보다는 ‘믿는 상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속에는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흔히 교리라고 부르는 것을 따를 때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나는 무(無)신론자는 아니고 비(非)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애초에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 어쩌면 생각하는 순간 거기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실체라 믿고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믿음이 없다면 기실 인간은 그다지 고귀하거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12월에 접어들면서 거리는 온통 성탄 분위기로 반짝인다. 설렐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설렌다. 이미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처럼 당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꿈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 말이다.
신용목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