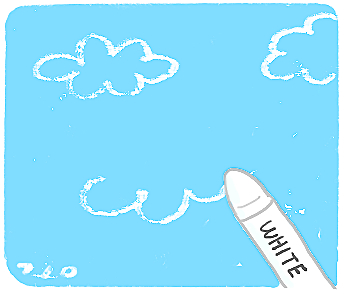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사전에 일정한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한다. 어떤 공부는 그 일의 전사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고 어떤 공부는 행위와 인식을 알맞게 숙련하는 것이다. 대개는 비중을 달리하며 이 두 가지를 함께해야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여서 공부가 필요하다.
몸과 마음을 다 쓰는 이 공부는 끝이 없어서 아무리 오래 시를 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멈추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투성’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삶 저편에는 늘 알 수 없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시인은 언제나 모르는 채로 그 미지에 대해 말하는 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 난감한 것은, 시를 공부하는 일은 그 끝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쯤 얼마만큼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 시간과 깊이의 정도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효율과 기능의 시대에 시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가 보기에 시를 읽거나 쓰는 일은 쓸데없어 보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며칠 전 함께 시를 공부하는 분이 저런 고충을 털어놓으셨다. 돈이 되지도 표가 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주변의 이해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성추문처럼 문학을 둘러싼 심심찮은 스캔들은 그런 고충을 더 견디기 힘든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시에 대한 거창한 수사들이 다 무용해지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나는 깊지 않은 경험과 당위적인 몇 마디를 보탰으나 사실 아무 대꾸도 못한 거나 진배없었다. 줄곧 생각했으나 여전히 마땅한 말을 찾지는 못했다. 시는 삶 너머의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제 말할 수 없는 장르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주말엔 눈이 내렸다. 눈이 녹으면 하얀색은 어디로 갈까, 어떤 시인은 이렇게 썼지만 정작 누구도 저 하얀색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잠시 세상을 덮어버렸다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하얀색의 일에서 경제성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눈에서 하얀색을 뺀다면 어떨까. 적어도 시가 없다면, 삶은 뻔해질 것이다.
신용목(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