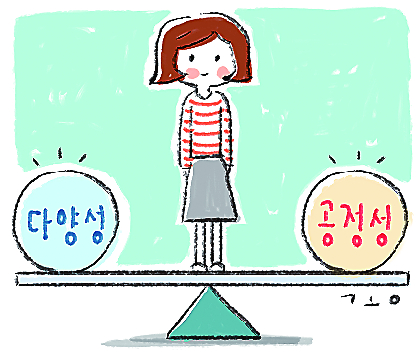
20대 시절 내 연애는 잘 못하면서 남들 연애상담은 많이도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상담을 빙자해서 실은 자기 연애사를 자랑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상하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기 의견이나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 연애에서 중용은 어렵기에 그런 과도한 기대를 갖지는 말라고 했다. 자상한 사람은 권위적인 면이 있고, 자유를 주는 사람은 때로는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동전의 양면 중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으며 오랜 시간을 지낼수록 뒷면이 드러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는 어렵다.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디에나 CCTV를 설치하고, 위치추적이 쉬워진다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인다. 나라면 감시를 당해도 안전을 보장받는 쪽을 택하겠지만, 반대를 고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황에 맞게 중용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사람의 즉각적인 판단이나 시스템이나 모두 중용의 지점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나는 고1 이후 사교육 없이 야간 자율학습, 교육방송에 의존해 시험으로 의대에 진학했다. 학원 다닐 형편은 아니었다. 그 시대의 줄 세우기 교육에 순응했고 수혜를 받았으니 교육 문제에 말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에서는 의대 진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학생부나 수시 등 다양한 전형이 생기면서 여러 재능을 가진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됐으나 다양성 장려를 명목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나 생각해본다.
행복은 당연히 성적순이 아니다. 공부를 잘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을 너무 자주 본다. 하지만 대학은 결국 공부하는 곳인데 꼭 다양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할까. 다양성과 공정성 사이 중용의 지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릴 적 선생님께서 봉투를 받고 다음 날 최우수상 수상자가 바뀌던 장면이 생생하다. 그 아이 엄마가 우리 애한테 상을 달라는 간곡한 편지인 줄 알았다. 내가 기억하는 장면은 과연 지나간 옛이야기일까.
하주원(의사·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