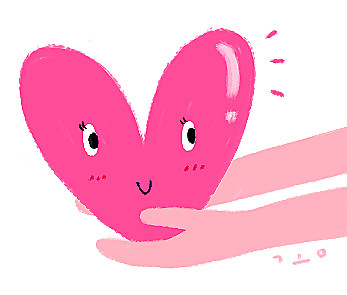
누가 직업을 물으면 난감하다. 내 이름 뒤에는 대개 ‘시인’이라고 씌어 있지만 그걸 직업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고, 시 쓰는 일을 ‘노동’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하다. 천상병 시인은 ‘가난이 직업’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런 낭만을 멋으로 받아줄 만큼 우리는 여유롭지 않은 듯하다. 최근엔 주로 ‘백수’라고 말하고 살짝 미소를 곁들이는데, 그러고 나면 짧은 순간 상대방도 나도 슬쩍슬쩍 서로의 표정을 살핀다. 인정하기 싫어도 백수라는 정체성 속엔 묻는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고 답하는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뻐근해진다. 물론 눈이 부쩍 침침해진 당숙모가 손을 꼭 맞잡고는 “아이고, 용목이 니는 요새도 백일장 댕긴다 카대” 말하는 속 깊은 정이나, 두루마기 차려입은 숙부가 넌지시 “축문도 아이고 지방도 지대로 못 쓰마 그기 시인이가?” 묻는 친근한 핀잔까지 돌려세울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해마다 듣다 보니 ‘한 해에 얼마나 버느냐’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 앞에 능청스레 지어 보일 웃음이 다 바닥나 버렸다. 속 좁게 굴 생각은 없다. 암울한 시대를 힘겹게 거쳐온 몸의 관성과 마음의 불안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속으로만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나 걱정되시면 차라리 현찰을 주세요.’ 투덜대고는 그러려니 넘기곤 한다. 그렇지만 매번 까끌까끌 불편하고 가끔 둔중하게 아프다.
나쁜 상사는 ‘딸 같아서’ 격려차 만졌다고 말하고, 나쁜 선임은 ‘동생 같아서’ 잘되라고 때렸다고 말한다. 폭력은 끔찍한 범죄지만 가족끼리면 다 좋다는 듯 핑계를 대는 것이 나는 더 무섭다. 가족이 폭력을 승인하는 요건이라면 가족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지옥이 되고 만다. 어쩌면 사랑이 부족해서 세상이 거칠고 각박해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 불편하고 아프게 하는 게 사랑이라면,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생활과 방식을 존중하는 만큼만 사랑해도, 사랑이라면 충분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고마울 것이다.
신용목(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