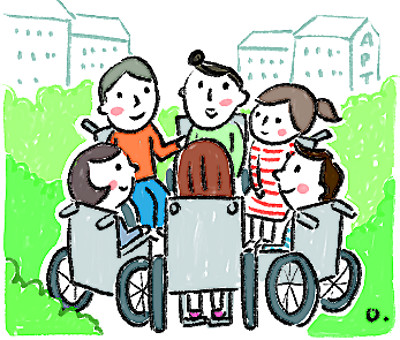
지난주 재활병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 오십 대부터 이십 대까지 다양한 연령이다. 모임 장소는 참석자들 중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이었다. 여러 대의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찾기 힘드니 차라리 속 편하게 밖에서 보자는 그이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따가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오래 수다를 떨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갑자기 닥친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었다. 아직은 건강했던 몸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많은 이들이다. 그래서인지 다들 불쑥불쑥 과거의 한때를 소환하곤 했다. 왕년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퇴물 복서처럼 한없이 쓸쓸하게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당당했는지 회상하다가 장애로 인해 힘들어진 현실을 토로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비장애인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법한 이야기들, 더 나이 들면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하고 싶다든가, 언제쯤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든가, 몇 년쯤 뒤엔 내 장사를 해보고 싶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하다못해 그 흔한 여행 계획조차 말하는 이가 없었다.
사실, 참석자들 중 나를 제외하곤 누구도 사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웹디자이너였던 여자는 경추를 다쳐 사지가 마비됐고, 케이블 설치 기사였던 남자는 흉추를 다쳐 하지가 마비됐다. 중견기업에 다녔다는 사지마비 청년은 법적으로는 복직이 가능했지만 차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나머지도 모두 비슷했다. 그날 모인 이들은 여전히 총명하고 부지런했지만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인력은 아니었다. 세상이 원하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진 우리는 언뜻 화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초미세먼지로 가득했던 날,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에서 식어빠진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건강했던 과거와 아픈 현실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다. 일 년여 만의 만남이었는데 다 함께 자리 잡고 앉아 고기라도 구울 수 있는 식당 하나를 찾지 못한 채 말이다.
황시운(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