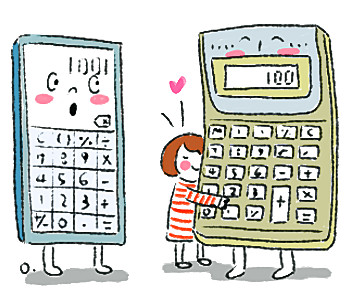
“게시판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 물청소를….” 안내방송이 시작됐는데 뭔가가 좀 낯설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여자 목소리이긴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여자 기계의 소리였다. 어떤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면 저렇게 방송되는 모양인데, 아나운서처럼 속도도 일관되고 발음도 정확했지만 ‘화법’이 실종됐다. 단어들이 찰진 말이 되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회전초밥 레일 위의 접시들처럼 그저 흘러가고만 있었다.
나는 여전히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전달사항을 읽는 방송에 익숙한 것이다. 음음, 하면서 목을 푸는 과정이 있는, 기침소리나 새는 발음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그런 방식 말이다. 내 취향이 보편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이 1980년대도 아니고 왜 육성으로 안내방송을 하느냐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으니 말이다. 물론 기계음이건 육성이건 싫어서 스피커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연결선을 떼어버린 사람도 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음량에 좌우되니 단지 기계와 사람의 대비로 말하기도 애매하다. 그러나 선택하라면 나는 보다 재래적인 방식이 좋다.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S는 “촌스럽게 왜 이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보다 더 촌스러운 애가 있다”고도 했다.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나 ㅋ”라는 답이 왔다. S에게 혹시 큼직한 버튼이 달린 계산기와 휴대폰의 계산기 앱 중에 뭘 더 자주 쓰냐고 물었다. S는 버튼 누르는 맛이 있는 계산기를 선택했다. 이어서 전자 달력보다는 종이 달력을, 디지털시계보다는 바늘 달린 시계를 선택했다. S는 족족 나와 같은 선택을 했고,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또렷한 취향의 문제다. 우리는 ‘아날로그 만세’ 쪽이다. 무선 마우스를 시도했다가도 다시 유선 마우스로 돌아오고, 배배 꼬인 선을 풀면서도 이편이 전지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고 믿는, 재래적인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그 효율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 묻는.
윤고은(소설가)
삽화=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