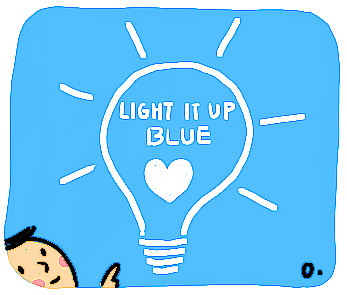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일상과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좀 더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됐다.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을 관찰하고, 미처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 요즘이다. 지난 2일이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이라는 것도 신문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자폐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유엔총회에서 지정된 이후 2010년부터 ‘파란빛을 밝혀요! Light It Up Blue!’라는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유명한 건물과 관광지는 물론 개인적 삶의 공간에 블루라이트를 켜거나 파란 옷과 파란 소품들로 이날을 기념한다.
어릴 적 ‘꿔다 놓은 보릿자루’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자폐증’이란 말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자신을 의심하면서 내면의 통증을 앓거나 주변 시선을 이상하게 의식하게 됐다. 나의 과장된 증상은 중학교 2학년 시절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 침묵의 세계에 빠졌었다. 세상을 향한 문을 안으로 열어 놓고 자신의 내면과 의식 속으로 치닫는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하고 문학적 가치를 두기도 했다. 문학의 언어는 실어증과 자폐증의 언어와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어긋나고 미끄러지고 텅 빈 언어 속에 삶의 비밀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피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 언어가 사회적으로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언어의 소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정상이라고 믿는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자폐증의 언어와 침묵은 우리가 잊어버린, 잃어버린 인간과 자연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유년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언어의 심연. 바다의 심연. 다양한 파란빛의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그들이 쓰고, 그리고, 만들고 있는 세계가 우리의 삶을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한다. 우리 역시 그 경계에서 파란빛을 좇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태용(소설가·서울예대 교수)
그래픽=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