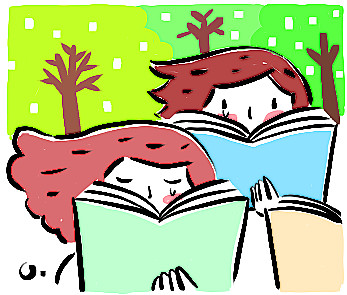
그림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작가, 교사, 도서관이나 책방 사람, 학생…. 하는 일도 나이도 다양한 어른들이다. 그들은 그림책 한 권을 품에 넣고 걷기 좋은 길을 찾아 모인다. 걸으며 얘기를 나누다 적당한 자리에 둘러앉아 책 이야기로 들어간다. 책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것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책이 나와 특별히 만나 파장을 일으킨 지점을 나누는 것이다. 그 나눔이 끝나면 책도 나눈다. 자신의 책을 선물하고, 남의 책을 선물로 받는다. 새로운 책이 각자에게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림책 길을 걷다’라는 모임이다.
주로 수도권에서 열리던 그 모임의 새해 첫 순서가 제주였다. 제주 사람과 전국 각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합해지니 평소 인원의 배가 넘었다. 우리는 곶자왈을 걸었다. 돌투성이 땅에 위태롭게 뿌리내린 나무와 덤불이 단단히 얽혀 사는 숲. 해설사는 식물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탱해주는지 설명했다. 경쟁하며 다투는 관계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크고 깊은 숲을 만들기 위한 순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장엄한 생명의 역사 한가운데 있음을 실감하면서 마음이 깊어진 때문일까. 사람들은 유난히 진한 속 이야기를 비춰 보였다. 애증으로 얽힌 누군가와의 관계, 가족의 죽음, 어린 시절의 소망, 책 주인공처럼 숨기고 있는 비밀….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사람이 드물지 않았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은 어느 얼굴에도 없었다. 그림책이 어떻게 자신에게 눈물과 웃음을, 질문과 해답을, 자유와 치유를 주었는지 목이 메어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나도 잠깐 목이 메었다. 이해도 관심도 없이 그야말로 바위를 붙들고 선 나무처럼 아슬아슬하게 커가던 그림책. 상처 입은 뿌리로 위태롭게 살아가던 사람. 그 둘이 서로를 지탱하며 자라난다. 새 가지 뻗고 새 살 돋아가며 단단해지고 무성해진다. 어쩌면 그림책 안에서 곶자왈 같은 신비로운 숲을 기대해도 좋겠다.
김서정(동화작가·평론가), 그래픽=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