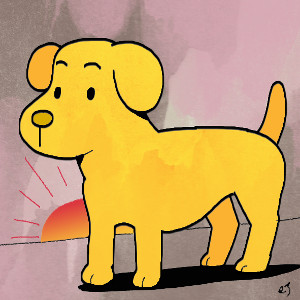
올해는 무술년(戊戌年)이다. 연초가 되면 늘 그렇듯 한동안 무술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덕담, 그리고 말장난이 이어질 것이다. 몇 마디 더 덧붙이고 싶지만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아재개그가 될 것 같아 넘치는 장난기를 그만두기로 한다. 독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게 맞다. 각설하고, 필자 역시도 무술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그 뜻을 읽고 왜 요즘 노란색 상품들과 전단들, 선물포장지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술년의 무(戊) 자는 황금색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물과 복의 해라고 풀이되기도 한다.
그러나 황금은 어쩐지 다른 세계의 물건 같고, 영원히 판타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을 것도 같다. 이 글의 제목도 처음에는 ‘황금색 강아지를 찾아서’라고 붙일까 하다가 바꿨다. 우리를 유혹하는 황금색 강아지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노란 개라는 말이 보다 현실감과 포근함이 느껴졌다. 병아리, 옥수수, 어린이집 자동차, 바나나우유, 반 고흐의 그림들, 피카츄, 저마다 노란색에 대한 추억은 다를 테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노란색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의 의미가 되었다.
다른 비유와 추상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 상징의 색. 그리고 온도. 슬픔과 분노의 색채와 온도가 우리를 좀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했다.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영원히, 노란색 앞에서는 걸음을 한 번 더 멈추게 되고, 언어의 정지 상태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마침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한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멀리 있어 자주 볼 수 없는 친구의 글자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답장에 ‘노란 개를 찾아 천천히 달려보자’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사건 사고의 여파와 더불어 주변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다. 새해가 되어도 이불 밖이 위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친구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 싶다. ‘노란 개는 우리 곁에 있어. 이미.’ 순간 친구의 언어가 노란 개의 꼬리가 되어 흔들렸다. 이불을 걷어내고 그만 일어나, 라고 말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불 밖으로 내민 손을 살며시 잡아주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싶다.
세상의 속도에 묻혀 살다가 가끔 걸음을 멈추더라도, 언어의 정지 사태를 겪더라도 우리 곁의 노란 개는 우리보다 먼저 걸음을 멈추고, 말 없는 긍정의 미소를 지어 보일 거라고. 그 미소가 황금보다 빛날 거라고.
글=김태용(소설가), 삽화=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