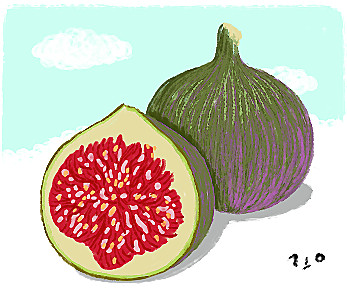
매번 마지막인 것처럼 무화과를 먹고 있다. 이맘때 무화과를 생과로 먹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무화과는 8월부터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과일이고, 거짓말처럼 겨울이 되면 사라져서 다음 해 초여름까지는 보이지도 않으니 말이다. 무화과 킬러인 나에게 네 달은 너무 짧다. 벌써 11월 말이니, 요즘에는 보일 때마다 두 상자씩 쟁여두게 된다. 이번 판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초조해하면서. “그거 술안주로 좋지.” 하면서도 C는 내가 왜 그리 다급하게 무화과를 먹어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우리가 전혀 다른 무화과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는 말린 무화과를, 나는 생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분을 머금은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싱그러운지에 대해 말하다가 ‘제철’ 예찬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말린다거나 얼린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제철에 그대로 과일을 먹는 것이다. 제철이라는 말이야말로 국산이라든지 유기농 또는 무농약, 그 외에 여러 인증 마크보다도 믿음직한 보증수표 아닌가. 내 말을 듣던 C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흠, 난 과일은 바나나랑 방울토마토만 먹어서… 매번 있던데.”
나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건 제철 과일 자체보다도 제철 과일을 헤아리는 라이프스타일인 것 같다고 말이다. 제철이란 말이 이미 철 지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철을 잊은 과일들이 출몰하는 세상이지만, 가끔 나는 생각해 본다. 딸기를 먹을 수 없는 철, 포도를 볼 수 없는 철, 홍시가 그리워지는 철, 그리고 무화과가 사라지는 철에 대해서. 그렇게 무언가가 ‘없는’ 날들을 상상할 때만 무언가가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자연의 놀라운 섭리다. 여름에 만났던 과일을 만나기 위해 다음 여름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계산법이 좋아서 나는 여전히 제철을 따진다. 연하고 부드러운 무화과는 이제 곧 증발할 테고 그 생각을 하면 좀 애틋해지지만, 기다리면 또 돌아온다. 자연이 주는 선물처럼.
윤고은(소설가), 그래픽=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