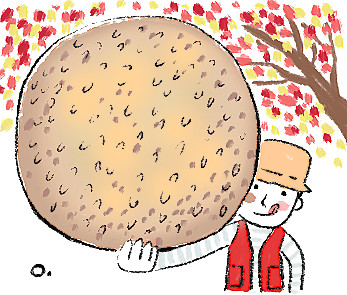
산행 때마다 누룽지를 한 봉지씩 가지고 오는 이가 있었다. 남들은 비상식으로 캐러멜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가져오는데 그는 한결같이 누룽지였다. 이가 부러질 것 같이 딱딱하지만 작은 부스러기를 물고 한참을 굴리다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고소한 맛이 살아났다. 확실히 오랜 기억속의 누룽지 맛이었다. 누룽지는 가마솥에서 긁어내야 제 맛이다. 무쇠솥은 아무리 밥물을 잘 조절한다고 해도 자칫 밥을 태울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누룽지를 긁는 놋숟가락이 하나쯤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부족한 때였다. 식구 수대로 밥을 푸다 보면 어머니의 밥그릇은 반도 차지 않을 때가 많았다. 적은 양으로 배를 채우려면 우거지며 나물을 넣은 비빔밥을 만들어야 했다. 반밖에 안 되는 어머니의 밥그릇을 본 철든 누나가 수저를 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 “어미는 이따 누룽지를 먹을 거야. 어서 먹어.” 오히려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을 덜어 주셨다. 부모님은 어린것들을 잘 먹이지 못하고 따뜻하게 입히지 못해 늘 아쉬워하셨다. 누룽지는 어머니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한숨이었다.
아버지가 상을 물리기 전에 부엌으로 간 어머니는 뜨거운 숭늉 그릇을 들고 와 빈 밥그릇마다 조금씩 부어 주셨다. 밥공기 밑에 조금 남은 누룽지의 구수한 맛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반짝반짝 윤기 도는 새까만 무쇠솥을 버리고 압력밥솥에서 전자밥솥으로 바뀌면서 밥 짓기도 많이 달라졌다. 첨단 전자기기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맛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밥이 눋지 않으니 누룽지가 있을 턱이 없다. 요즈음 세대는 식사가 끝나면 으레 커피를 찾는다. 그러나 옛 맛을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지 누룽지를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 더 나아가 현미누룽지가 있는가 하면 당뇨에 좋다는 기능성 누룽지까지 나돌고 있다. 누룽지 튀김이 이제는 비스킷이나 초콜릿처럼 우리 입맛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누룽지는 쌀로 만든다. 누룽지가 우리의 맛을 되찾아주고 남아도는 쌀 소비에도 한몫해 준다.
오병훈(수필가), 그래픽=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