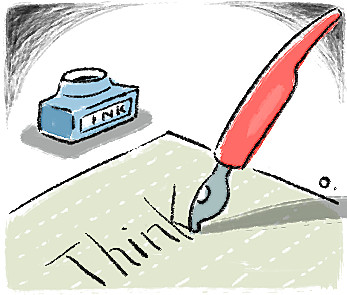
내가 머물렀던 암스테르담의 호텔에서는 ‘THINK IN INK’라는 문장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리듬감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잉크로 생각’하라는 메시지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집, 프린선흐라흐트 263번지에서 그 문장을 곱씹게 됐다. 이 집에는 책장으로 가려진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 경계를 통과하면 오디오가이드의 안내도 멈춘다. 안네를 포함한 여덟 명의 사람들이 이 책장 뒤에서 2년간 숨어 지냈다. 나치즘이 점령한 시기, 그들은 유대인이었다. 결국엔 발각되어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고, 종전 이후 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뿐이었다.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 건 다른 식구들이 죽었다는 사실과 안네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에 “종이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고 썼던 안네는 종이와 잉크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다. 빨간색 체크무늬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수다 떨 듯 일기를 썼다. 키티는 안네의 삶에 대해 증언했고, 많은 사람이 안네를 기억하게 됐다.
걸을 때마다 마룻바닥이 삐거덕대고, 창문은 단단히 밀봉해둔 것처럼 보이는 집에서 스스로를 수다쟁이라고 밝히는 소녀가 자랐다. 뛰고 춤추고 싶은 마음에 대해 쓰면서 걸음도 기침도 조심해야 하는 현실을 견뎠다. 안네에게 키티는 또 하나의 비밀통로였고, 현실에 없던 창문이었다. 나는 중학생 때 ‘안네의 일기’를 처음 읽었고, 솔직한 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은신처가 이렇게 암스테르담 한복판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때로 어떤 것들은 가깝게 있어서 더 잔인해지는데, 저 창문 너머에 있을 풍경이 꼭 그렇지 않은가. 전쟁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앗아간다. 방문객은 동선의 끝자락에서 오토 프랑크의 사진과 마주하게 되는데, 1960년 그가 이 집을 다시 찾았을 때의 모습이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한 시대가 저 사람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전쟁이야말로 지독한 월권행위가 아닌가, 하고.
윤고은(소설가), 그래픽=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