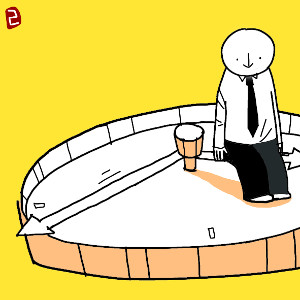
손목시계는 손목 위에 있을 때 가장 멋져 보인다. 아니면 판매대의 진열장 안에 있을 때. 적어도 이렇게 내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시계 여섯 개가 마치 잡은 지 오래된 생선들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색깔, 크기, 가리키는 시각이 모두 다른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초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시계 약을 교체해달라고 하자 수리점 주인은 시계가 멈춘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 앞에서 나는 얼버무렸다. “글쎄요, 한 3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시계마다 다를 걸요?” 수리점 주인은 멈춘 지 너무 오래되면 약을 갈아도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게 분명한, 어리벙벙한 손님에게 설명을 해줬다. “오래 방치하면 얘도 굳어요. 무브먼트에 손상이 가거든요. 시계도 오래 쓰려면 약을 잘 갈아줘야 해요.”
예전에 만년필 수리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재기가 힘들어지는 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사물에게도 교체와 회복의 시한이 있다니, 그건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고 어찌 보면 피곤한 일이었다. 나는 내 몸 하나뿐 아니라 소유한 물건들까지 다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거랑 이거는 오늘 날짜를 적어뒀어요.” 수리점 주인은 약을 교체한 시계들을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어디에 날짜를 적어뒀다는 말인가, 하고 시계를 살피다가 한참 후에야 내부에 적어뒀다는 말인 걸 깨달았다. 이제 이 시계들은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흐르기 시작했다. 건강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지점에서 멈추게 될 테고. 그중에 하나를 탁상시계처럼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손목시계가 차지한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밤이 되니 얘기가 달라졌다. 뭔가가 내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는데 시계의 맥박이 뛰는 소리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 말이다. 결국 시계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시간의 안락사라고 해야 할까. 아무래도 나는 그런 상태에 익숙해진 거다. 너무 오래.
글=윤고은(소설가), 삽화=전진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