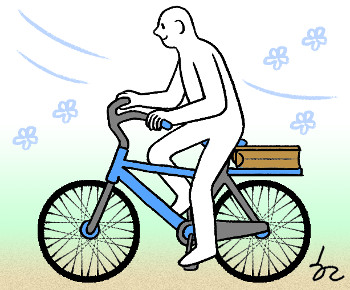
나는 자전거다. 요즘 몸값이 꽤 올랐다. 전용도로가 있고, 지하철을 탈 수 있으니 대접도 나아졌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골수팬이 있을 정도로 인기 짱이다. ‘동호회’가 나를 혹사시키지만 괜찮다. 승용차도 멋있지만 나도 나름 자부심이 있다.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거나 배처럼 바다 위를 달리지는 못한다. 땅에선 못가는 곳이 거의 없다. 두 다리만 있으면 된다. 어디 이뿐인가. 큰돈 들어가지 않고, 건강마저 선사한다. 미세먼지는커녕 매연조차 배출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혹자는 나와 환경을 결부시키지만 그냥 친구로 봐주면 더 좋겠다. 언제든 편하고, 어디론가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베프’ 말이다. 이재오 박찬석 강운태 정두언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졌지만 아쉽게도 그들이 눈에 띄는 환경정책을 입안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된다니 듣기 좋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승수씨는 한때 나를 타고 출근했다. 당시엔 사건이었다. 세간의 반응은 ‘신선하다’가 주류였다. 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는데 그땐 어깨가 으쓱했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튄다’ ‘품격 없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자전거와 품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이정현 의원은 나를 타고 선거 운동을 했고, 과거 정부에서 그 어렵다는 호남에서 여당 후보로 당선됐다. 한데 정치인들의 자전거는 간혹 ‘쇼’다. 그럴 땐 기분이 언짢다.
인간이 걷기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이동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이 자전거다. 소형차 가격에 버금가는 것도 있다지만 대체로 비싸지 않다. 텔레비전처럼 부의 상징인 시절도 있었다. 1960, 70년대 시골에선 돈깨나 있는 집안 자식이어야 자전거 타고 학교에 다녔다. 이젠 다르다. 서울 자전거대행진 2017 행사가 어제 열렸고, 50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많다. 연간 1만7000여건의 사고가 나고, 사망자도 280명에 달한다. 슬프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자동차였다면 꼼짝없이 면허증을 빼앗기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데 처벌 규정이 없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야말로 반가운 소리다. 인기에 걸맞은 법적, 행정적 제도가 뒷받침됐으면 하는 게 내 작은 소망이다.
박현동 논설위원, 그래픽=이영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