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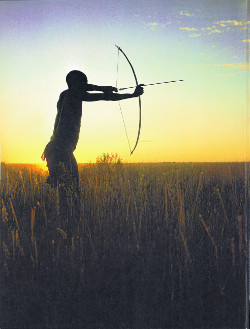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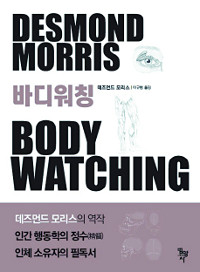
저 멀리, 그녀가 걸어온다. 긴 머리카락, 투명한 피부, 선명한 이목구비…. 연극 무대처럼 세상은 암전되고 당신 눈에 들어오는 건 그녀밖에 없다. 그녀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 이게 바로 인연이라는 것일까.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인간은 좋아하는 뭔가를 보면 동공이 커진다. 어쩔 수 없이 망막은 많은 빛에 노출되고 세상은 흐릿해진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당신에게 걸어온다면, 당신 눈에는 은은한 후광에 쌓인 상대만 보일 수도 있다.
영국 학자 데즈먼드 모리스(89)의 ‘바디워칭’이 드디어 복간됐다. 세계적으로 1000만부 넘게 팔린 ‘털 없는 원숭이’(1967)를 쓴 바로 그 동물학자다. 책에는 앞서 전한 눈에 대한 과학적 이야기처럼 인체의 비밀을 흥미롭게 풀어 쓴 내용이 가득하다. 1985년 미국에서 출간됐고 국내에는 이듬해 번역됐는데 2000년대 초반 절판돼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바디워칭’은 인체를 다룬 최고의 백과사전 중 한 권일 듯하다. 저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면밀히 살핀다. 신체 부위 20곳을 각각 한 개의 장(章)으로 구성해 들여다본 구성이다. 해부학적 특징을 전하면서 기능 생리 진화 성장의 스토리를 포개고 신체를 둘러싼 인류의 미신과 편견까지 꼬집는다. 미려한 문장과 엄청난 정보량이 독자를 압도한다.
인체를 낯설게 보도록 만든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첫머리를 장식하는 챕터 ‘머리카락’을 보자. 저자는 머리카락의 수명이나 기능을 살피기 전 이렇게 적었다.
‘100만년이 넘도록 우리들은 무성하게 자란 커다란 털뭉치를 머리에 이고 거의 알몸으로 뛰어다녔다.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출렁대는 망토처럼 치렁하게 자라났다. 꾸미지도 않고 모양새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영장류에게는 놀랍게 보였으리라.’
흥미를 돋우는 내용이 너무 많다. 가령 여성 유방이 반구형(半球形)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 암컷은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가 아니면 유방이 평평하다. 인간만 다르다. 반구형의 형태는 수유(授乳)에도 적합하지 않다. 아기가 유방에 짓눌려 숨을 쉬는 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반구형 형태를 띠는 건 성적(性的)인 이유에서다. 인간은 직립 보행을 하게 되면서 신체 앞면을 통해 성적 신호를 어필해야 했다. 다른 영장류 암컷들은 엉덩이로 성적 신호를 보내는데, 인간에겐 가슴이 ‘모방적 궁둥이’ 역할을 한 셈이다.
남자들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이유를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을 도마에 올린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고전 11:14). 이 말씀이 계기가 돼 2000년 넘게 남자들의 짧은 머리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물론 짧은 머리가 비단결 같은 긴 머리보다는 남성적 ‘이미지’를 풍겨서 남성들이 오랫동안 짧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했을 거라는 내용도 곁들인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챕터는 ‘발’이다. 뼈 26개, 인대 114개, 근육 20개…. 저자가 전하는 발의 ‘실체’는 그야말로 경이롭다. 오죽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을 ‘공학의 걸작’이라고 불렀을까. ‘우리들이 뒷다리로 걷기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들은 앞다리를 해방시켜, 거머쥐고 조작할 수 있는 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도구를 만드는 손을 이용하여 우리들은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발에 커다란 은혜를 입고 있으며, 우리 신체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존경해야 마땅하다.’
세상에는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를 뒤지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담은 책들이 존재한다. ‘바디워칭’이 그런 책이다. 끝내주게 재밌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