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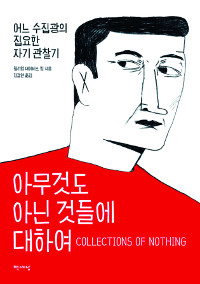
창세기 2장 2절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많은 성도들은 여기서 안식일의 유래를 확인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극무용과 교수인 윌리엄 데이비스 킹(62)은 다르다. 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신은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창조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신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좋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주 안에 창조될 자격과 자리매김할 자격이 있다. 그것은 돌봄과 정리, 보존과 평가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
킹 교수가 규정하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무언가다. 그가 이런 것을 예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세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고 모으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킹 교수의 인생이 담겨 있다.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킹 교수의 컬렉션 목록은 기묘하기 짝이 없다. 통조림 생수병 맥주 등에서 떼어 낸 식료품 라벨 1만8000여개, 시리얼 상자 1500여개, 병뚜껑 500여개, 치약 상자 120여개…. 그야말로 기행(奇行)에 가까운 ‘수집의 삶’이다.
기행의 근원을 찾으려면 킹 교수의 인생 궤적을 되짚어야 한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작은 도시 캔턴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는 여덟 살 많은 누나가 있었다. 누나는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를 앓았고 정신도 온전치 않았다. 항상 큰소리로 말했고 뜬금없이 낄낄거렸으며 가끔씩 발작을 일으켰다.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던 건 불문가지다.
수집은 어린 시절의 킹 교수에게 결핍과 공허의 감정을 달래주는 행위였다. 열한 살 때 우표 수집이 시작이었다. 편지 봉투에 우표 위치를 표시한 작은 사각형 이미지도 잘라서 모았다. 고교에 진학한 뒤에는 수집 행태가 더 기괴해졌다. 녹슨 못이나 볼트, 침대 스프링 같은 쇠붙이를 주우러 다녔다. 어른이 돼서는 시리얼 상자 등이 주요 컬렉션이 됐다.
그에게 수집은 어떤 의미일까. 수집에 대해 고찰하는 문장이 이어진다. ‘수집은 세계의 낯섦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것은 방랑벽의 한 형식이다’ ‘수집은 사랑과 그 사랑의 상실에 대해 말해준다. 또한 수집은 자기가치와 자기혐오에 대해 말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서투름에 대해 말해준다’….
책은 수집 철학을 논하는 대목 위에 저자의 인생 스토리가 포개지는 구성을 띤다. 킹 교수는 암울했던 유년기와 외로웠던 청소년기를 통과했고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컬렉션의 세계는 그에게 안식처였다. 이 세계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왕(King)이 될 수 있었다.
프로이트의 이론 등을 빌려와 수집가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대목도 인상적이다.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는 독자라면, 어떤 것을 수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할 내용이 적지 않다. 세상에 둘도 없을 저자의 컬렉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이 책이 선사하는 재미다.
‘수집을 시작했을 때부터 원한 존재들. 수집은 그런 존재들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 어떤 인간 존재도 뭔가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는데, 죽음이 소유를 휩쓸어가기 때문이다. … 나는 필시 수집을 계속할 것이다. 습관과 본능과 반사 작용과 죽음에 대한 일종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