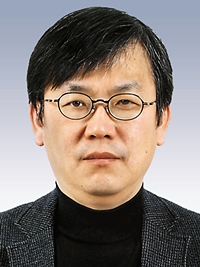
교회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군데군데 밝혀진 등을 벗 삼아 수백 계단을 내려가고, 군데군데 물이 흐르는 좁은 통로를 구불구불 거친다. 맑고 투명한 표면이 검은빛을 반사하는 지하 호수를 지나자 아름다운 예배당이 눈에 들어온다. 지상에서부터 100m, 킹가 교회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낸다.
교회 자리는 본래 소금광산이었다. 폴란드 비엘리치카에 있다. 소금을 캐려고 들어왔던 광부들은 통로 여기저기에 신앙의 흔적을 새겼다. 투박하나마 소금을 깎아 신의 형상을 마련하고, 마음속 소망을 빌었다. 길이 54m, 너비 평균 17m, 높이 최대 12m인 이 거대한 교회는 그 연장선에 있다. 채굴에 쓰인 간단한 광산 도구들만으로 암염을 파고 쪼고 깎아 성스러운 공간을 열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모두, 즉 성상도, 제단도, 부조도, 샹들리에도, 심지어 벽과 계단조차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의 모습이 될 때까지 1896년부터 무려 70년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간절하게 한 걸까?
아우슈비츠는 인간을 절망시킨다. 단단한 가스실 시멘트벽을 파고든 손톱자국은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긴다. 인간 안에 있는 짐승이 마음껏 날뛰도록 이성이 우리를 방치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누군가는 무심히 가스실 스위치를 올린 후 애견과 산책을 했고, 누군가는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넣고 태운 후 휴가를 떠나서 웃고 떠들었으며, 누군가는 시체로 변한 이들에게서 얻은 머리카락으로 모포를 만들었다. “이것이 인간인가?” 수용소의 생존자인 작가 프리모 레비는 우리에게 묻는다. 때때로 터져 나오는 울음 자체가 대답이 된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시비엥침에서 이 인류사적 비극이 일어나는 끔찍한 시기에도 킹가 교회는 중단과 계속을 반복하면서 형태를 갖추어 갔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우슈비츠를 떠나온 탓일까. 검은 동굴에 마련된 교회 불빛이 더욱더 따스한 안식과 아늑한 평온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의 신은 인간을 절망에 남겨두지 않는다. 토할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잦아들면서 간신히 마음 하나가 굳게 일어선다.
‘잊지 않겠다.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짐승에 지지 않겠다.’
참혹한 야만이 나치한테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마주친다. 제 실적을 위해 감염병을 은폐한 관리,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장사꾼, 자가 격리 중에 돌아다니는 접촉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외면하는 일부 종교인, 연대와 사랑이 아니라 혐오와 공포를 연출하는 정치인 등은 우리 안의 나치다. 인류가 오랜 노력 끝에 길들여 온 내면의 야수에 패배한 자들이다.
이익에 홀리거나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번쯤 언행의 윤리를 살펴보는 것이 성숙함이다. ‘더 나은 인간’을 향한 분투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언제든 짐승으로 타락한다. 일찍이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생각하기를 잠시만 멈추어도 악과 손잡는다. 내면의 짐승이 날뛰지 못하게 하려면, 인간은 끝없이 자기를 초월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이 반드시 신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때문일 것이다. 내면에서 신성의 촛불이 꺼지면 인간은 자기 속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신념에 홀리는 나치가 될 수 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힘이다. 견디지 못할 고통이 회복으로, 이기지 못할 좌절이 구원으로, 일어서지 못할 패배가 승리로 바뀔 때 생기는 희열이다. 킹가의 광부들은 죽음 같은 동굴에서 힘든 노동 끝에 ‘회색 황금’을 캐냈다. 그러나 이들은 지친 몸을 이기고 끝내 어둠을 빛으로 만들었다. 소금 벽 위에 망치와 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희망의 영토를 일구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야만의 폭풍에 휩쓸리는 대신 자기 존엄을 지키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아우슈비츠와 킹가를 새삼 떠올리는 이유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