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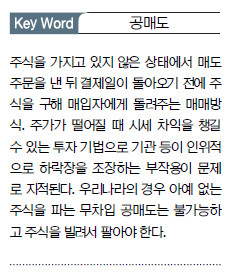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공매도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공매도가 코스피의 대세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주 중심 상승장에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제도 비판에 목소리를 높인다. 시장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매도가 이처럼 개선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매도당하는 이유는 뭘까.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매매 기법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예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한다.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해당 주식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거나 고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사서 빌려준 증권사에 갚는다. 처음에 팔았던 가격에서 떨어진 가격만큼 차액을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본다.
금융투자협회의 주식 대차거래 추이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15일 기준 빌린 주식 잔고는 72조3543억원이었다. 3개월 전인 2월 15일 54조3493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빌린 주식이 모두 공매도로 활용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빌린 주식이 많을수록 공매도도 많아지는 것으로 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실제 공매도가 이뤄진 수치를 나타내는 공매도 잔고 수량은 지난 2월 15일 2억8443만주에서 지난 10일 3억1683만주로 비교적 꾸준히 늘었다. 코스피가 고점이 됐다는 판단에 향후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주가 상승이 예상되면 주식을 사고 하락이 예상되면 공매도를 하는 개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방지하고, 하락장에도 꾸준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도 있다. 공매도를 한 후에는 어쨌든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사서(숏커버링)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무한정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공매도 투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성격이 있다는 점이다. 개인도 증권사의 대주거래를 이용하면 공매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빌릴 수 있는 종목, 수량, 기간이 한정돼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약 1년간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은 1∼2개월 정도로 제한된다. 증권사들은 개인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장기간 대량 주식대여를 허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한다. 주식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관 등이 장기간 주식을 빌려 놓고 지속적으로 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 개인은 대응이 어렵다. 특히 주가 하락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종목의 경우 이미 물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도 쉽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2011년 1.82% 수준에서 지난해 10월까지 6.32%로 상승했다. 공매도는 활성화되는데 대응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보니 개인투자자 등의 불만이 높아져왔다. 통계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대여비율이 압도적이라 개미들이 공매도의 먹잇감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6일부터 1개월간 주식대여자의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51%, 국내 증권사가 25%, 국내 자산운용사가 10%를 차지한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2013년 4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방어에 연구·개발 자금까지 투입되는데 금융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30일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당시 하루 공매도 거래의 절반이 악재 공시 이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
현재 운영되는 공매도 규제는 크게 공매도 공시제도 및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있다. 공시제도는 특정 종목 주식 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를 매일 공개하는 제도다. 공시 부담을 안게 되니 공매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실제 공매도로 수익을 얻는 외국계 헤지펀드 등은 파악이 어렵다. 공매도 주체인 헤지펀드는 숨고 한국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 외국계 증권사만 공시되는 구조다. 외국계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국내 증권사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당일 거래량 중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 공매도를 다음날 하루 제한한다.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7일 이후 요건을 충족한 종목은 삼성SDS, 컴투스, 대원제약 3종목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주식시장이 최근 상승세를 타 공매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19대 대선 기간 이런 비판을 의식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매도와 관련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의 공매도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공매도를 사전 예고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최장 6개월 범위에서 사전 예고한 기간, 물량 내에서 공매도를 하고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소액투자자 거래·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매도 관련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및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과도하게 규제 수준을 높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원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매도 규제를 충분히 강화해온 상태”라며 “기관과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이지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공매도를 가능하게 한 상품을 출시했다. 투자자가 최대 5종목까지 선택하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한 파생결합증권(ELS)을 증권사가 발행해 투자하는 구조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