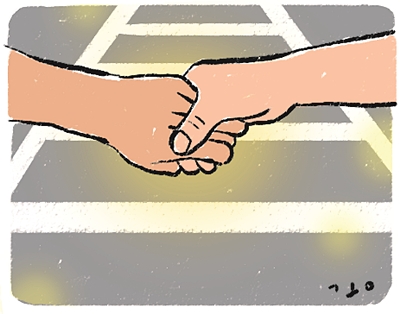
“어머 얘가 왜 이래!” 아이가 불쑥 진료실 모니터 선을 잡아 넘어뜨리자 아이 엄마가 외쳤다. 하지만 엄마의 시선이 향한 것은 아이보다도 내 표정이었다. 오랜 진료 기간 동안 아무리 아이 증세가 나빠져도 침착한 대처와 태도로 내심 존경하던 보호자였다. 때문에 그 순간 무너진 태도와 시선이 더 당황스러워, 혹시 내가 화를 낼까 봐 걱정하셨던 걸까. 다른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의아했지만 답을 알 수가 없었다. 그날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내가 다리를 다쳐 여러 번의 수술과 재활을 시작하게 되면서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나는 내 의지와는 별개로 남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루는 가족 모임을 위해 식당에 갔다. 배정된 자리가 넓은 식당의 맨 끝이라 익숙하지 않은 목발로 진땀을 흘리며 홀을 가로지르는데, 목발과 내가 세트로 식당 손님들과 직원들의 온 시선을 끌었다. 저런 다리로 여기를 오냐, 보기 불편하다는 속삭임과 시선들이 흘끔이며 뒤섞였다. 번잡하던 식당 안이 급 조용해지니 꼭 다들 나만 지켜보는 것 같았다. 물론 실제보다 당시 의기소침해진 내 마음 탓에 과장된 느낌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뿐 아니라 가족 모두 당황한 나머지 음식 맛은커녕 이야기를 나눌 겨를도 없이 다들 부랴부랴 식사를 목에 부어 넣다시피 하고 일어서버렸다.
환아와 보호자들은 종종 병보다도 시선의 날카로움이 더 아프다고 한다. 건널목 한중간에서 병적인 증상으로 꼼짝 않는, 어느새 자신보다도 커버린 아이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 매달리던 한 보호자는 ‘쯧쯧’ 혀 차는 소리와 끊이지 않는 경적, ‘저런 애를 왜 데리고 나와서…’라는 중얼거림이 귀에 쉬지 않고 꽂히자, 그대로 아이를 안고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의 손 저지레에 순간 내 표정부터 살피던 그 어머니도, 배려 없는 시선의 칼끝이 행여 아이의 치료자에게서도 나올까 봐 본능적으로 살폈던 것은 아닐까.
아주 가냘픈 ‘정상 범주’ 안에 욱여넣어진 이들이 아니라면 평범한 산책마저도 어렵다. 우리 사회의 장점이 참 많지만, 더불어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여유롭고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환했으면 하는 욕심이 든다.
배승민 의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