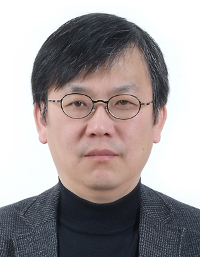
금요일 저녁 퇴근할 때 본 양재천 풍경은 아직 황량하더니,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열었다. 뻗어 나간 나뭇가지 사이로 군데군데 검은 흙이 드러난 공원 풍경이, 주말 사흘 만에 붉고 흰 물감을 공중에 흩뿌린 것 같다. 안개가 일어선 듯 는개가 내리는 듯 눈을 감아도 어두워지지 않고 여전히 사물거린다.
헤어져 사흘이면 선비를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연 또한 며칠이면 눈을 떼지 못할 변화를 일으킨다. 하기야 인간에게 있을 법한 일이 어찌 자연에 없겠는가. 습관적 인식을 무너뜨리고 정해진 경로를 이탈한 현실의 도래가 기적이라면, 비루한 일상 탓에 모르는 채 잊고 지낼 뿐 신은 어디서나 목소리를 내고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벚꽃의 기척을 즐기는 이들이 분주하다. 겨우내 운동 나온 몇몇 이들이 고작이더니, 양재천 길을 따라 홀로, 둘이, 셋이, 다섯이, 아니 온 세상 사람이 몰려든다. 나무 아래 자리를 깔고 누워서 쏟아지는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꽃들을 올려다보고, 줄줄이 늘어선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서 봄꽃의 향기를 옷에 묻히며, 꽃잎들로 움직이는 바람의 형태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 신의 숨결이 사람들 속으로 옮겨붙는 것 같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담아두려고 안간힘이다.
생동하는 봄을 만끽하고, 흐르는 봄을 담으려는 우리의 열정을 부추기는 것은 비통하고 참혹한 우리의 생활이다. 하루하루 입술이 타는 듯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차디찬 겨울을 이제 막 건너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아 있음이 불가사의, 꽃그늘이여.” 일본의 시인 잇사의 열일곱 자 하이쿠다. 고단한 몸으로 수시로 내려앉는 병을 견디면서 오늘내일 간당한 목숨 줄을 부여잡았는데, 살아서 이 꽃을 보다니, 이 아름다움을 더 만나다니, 생각을 동원하고 마음을 집중해도 도무지 이 눈부심을 이해할 수 없다. 아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만큼 비참하고, 또 그만큼 절박하다.
우리는 이 꽃들이 바람 속에서 스러지기 전에, 인생이 허무로만 기울지 않도록, 이 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이 세상은 사흘 못 본 동안의 벚꽃.” 료타의 하이쿠는 얼마나 슬픈가. 벚꽃은 피는 일에도 사흘이었는데, 지는 일에도 사흘이면 족하다. 인간은 도저히 내일 행복할 수 없는 법이다. 아무리 지지부진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닫는 말에서 문득 눈에 들어온 벽 속의 틈과 같나니. 나중을 기약하며 현재의 찬란함을 놓치는 것은 무척 어리석다. 매일의 점심인데 한 끼쯤 거르면 어떠며, 매일 돌아가는 집인데 하루쯤 미루면 어떠랴. 짧디짧은 봄을 잃기보다 만개한 꽃 속에 모습을 의탁한 채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천천히 거니는 쪽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의 이 감동을 삶으로 데려가는 일은 쉽지 않다. 기억이란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눈부신 사태 앞에서는 언어의 길이 잘 끊어지는 까닭이다. 너도나도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놀리지만, 사진의 언어로 마음을 담는 일은 또 얼마나 어려운가. 피부가 받아들인 생생한 느낌을 숙고를 통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대신, ‘인생 샷’을 기대하면서 이곳에 서고 저곳에 기댄 비슷비슷한 사진 수백 장을 남기는 데 몰두해도 나중에 허무할 뿐이다. 대부분 한 계절도 지나지 않아 들여다보지도 않거나, 잘해야 인스타그램 등에서 하트 몇 개를 위해 데이터 사업자들을 위한 연료가 되는 사진들에 그치게 마련이다.
나중까지 간직되는 것은 깊이 음미된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함 그대로 마음의 언어로 이룩하지 못한다면, 바삐 움직이며 찍은 사진이 나중에 무슨 말을 건네겠는가. 그래서 꽃구경에는 시가 필요하다. 꽃의 감각적 아름다움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이 봄과 함께 영원의 언어를 얻을 수 있다. 조선시대 이황은 ‘봄을 느껴서(感春, 감춘)’에서 “붉은 벚꽃은 향기 나는 눈처럼 나부끼고(紅櫻香雪飄, 홍앵향설표)/ 흰 오얏꽃은 은빛 바다처럼 물결치네(縞李銀海飜, 호리은해번)”라고 읊은 바 있는데, 오늘 이 그림이 그 풍경이 아니겠는가. 또한 박인량은 ‘상춘곡(賞春曲, 봄 즐기는 노래)’에서 “칼로 말라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라고 노래한 바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조물주 손이 닿은 그 경치가 아니겠는가. 시처럼 음미된 언어가 있을 때 삶은 비로소 영원을 기약할 수 있다. 올해 꽃구경에는 카메라와 함께 시집을 챙겨 가면 좋겠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