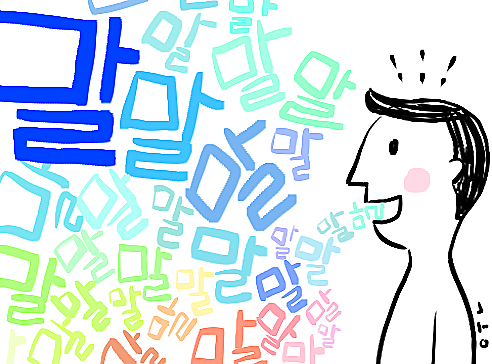
유행어를 쓰지 맙시다가 하나의 표어였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인기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영구 없다’ 또는 ‘잘돼야 될 텐데’ ‘안녕하시렵니까’ 이런 말이 욕설도 아니고 남을 비하하는 것도 아닌데 따라하는 것을 왜 쓰지 말자고 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불조심도 아니고, 물을 절약하자는 것도 아니고, 유행어를 쓰지 말자는 주장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물론 비속어도 있지만 모든 유행어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뇌가 먼저 명령하고 거기에 따라 몸이 움직이거나 감정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때로는 뇌도 하위 기관의 신호를 받아(bottom-up)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에 의해서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결정된다. 무의식이 결국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신조어에 대해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친다며 우려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사람들의 말도, 거기에 따른 생각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영어에도 줄임말과 신조어가 쏟아지는데, 시대와 상관없이 예전의 단어를 쓰는 것이 꼭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 신조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되묻거나 검색해볼 때가 많다.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나쁜 것은 아니니까. 요즘 10대들이 쓰는 급식체나 신조어를 보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통찰을 느끼기도 한다.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겉으론 친하면서도 속내는 털어놓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친구라는 단어로 부른다는 것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겉친’이나 ‘밥메이트’라는 단어를 보며 참 잘 만들었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구나 싶다. 영어에서 왔지만 ‘워라밸’이 화두가 되면서 일만 해 오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일과 여가의 균형, 새로운 시간 분배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는 사람도 있다. 언어는 하나의 도구이며 결국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게 된다. 1980년대 딴따라로 불리던 연예인이든, 현재의 인터넷 커뮤니티든 당시 그런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신조어를 만들 수도 없는 일이지 않을까.
하주원 의사·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