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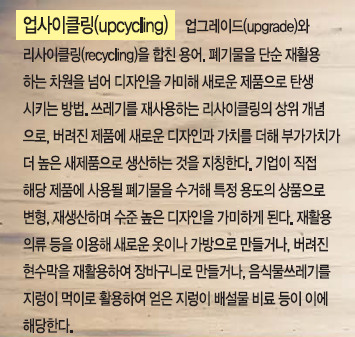
산업화 이후 인류 최대의 골칫덩이는 아마도 각종 쓰레기일 것이다. 상품 대량생산 시대가 시작된 20세기 이후 지구는 선진국들의 번영과 함께 스모그, 산업폐기물, 이에 따른 각종 환경공해로 몸살을 앓았다.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자동차 매연과 산업폐기물의 재순환·재활용 정도는 놀랄 정도로 향상됐지만 여전히 21세기까지 남은 문제는 각 가정과 주민들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생활쓰레기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생활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80년대부터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들은 본격적인 쓰레기 리사이클링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쓰레기를 분류해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제도 말이다.
어느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쓰레기 대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만 이를 폐기할 곳은 줄어들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이제 우리 땅에 다 매립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아프리카 국가들로 이전된다. 산업화와 첨단 생활화가 잘 진행된 선진국들은 쓰레기도 후진국으로 수출한다. 하지만 쓰레기 수입국들도 더 이상 쓸모없는 선진국의 생활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게 됐다.
지난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 등과 함께 올해 말부터 선박과 자동차부품, 스테인리스스틸, 티타늄, 나무 등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폐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곧바로 우리나라는 쓰레기 대란을 겪었다.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등에 대한 분리수거가 한동안 원활하지 못했고, 동네마다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내다 버리겠다는 주민들과 수거하지 않는 지자체 위탁업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온 리사이클링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폐기물을 수거해 단순 재활용에 그치는 리사이클링으로는 더 이상 생활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자각이 곳곳에서 일어나서다. 새로운 대안은 바로 ‘새활용’, 업사이클링(up-cycling). 버려진 제품에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더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으로 생산해내는 방식이다.
업사이클링, 정부 대신 기업!
리사이클링이 재활용의 무한반복과도 같다면 업사이클링은 부가가치를 덧붙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작업이다. 새로운 이윤을 발생시키고 기업들이 돈을 벌이들일 기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 업사이클링의 주체는 ‘관료주의적’인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아닌 ‘창조적’인 기업과 개인이다. 폐기물 수거부터 변형, 디자인,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개인이 책임진다.
지난 2월 영국 런던의 해러츠(Harrods) 백화점은 쇼윈도를 버려진 옷가지들로 장식했다. 밝은 조명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노출됐다. 쇼윈도 옆엔 옷을 버릴 수 있는 수거 구멍이 있었다. 백화점 측은 이 이벤트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베트멍 손목밴드를 사은품으로 지급했다. 백화점 측은 “양심적인 쇼핑이란 뭔지에 대한 자각을 소비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각종 폐기물을 재료로 만든 수많은 ‘양심적’ 업사이클링 상품이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에선 업사이클링이 대세가 돼 가고 있다. 다양한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들이 기발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꺼내들고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영국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는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종이 대신 ‘노트랩(Knot Wrap)’이라는 이름의 천보자기와 물에 녹아 분해되는 옥수수 전분 충전재를 상품 포장재료로 쓰고 있다. 스웨덴의 세계적 스파 브랜드인 H&M은 ‘컨셔스(Conscious)’란 레이블을 붙여 업사이클링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쓰레기가 된 천을 재료로 제작된 상품들이다. 청바지 과잉 생산을 스스로 막는 네덜란드 데님 브랜드 ‘머드 진스’, 트럭 방수천으로 가방을 만드는 ‘프라이탁’, 버려지는 빵 부스러기를 원료로 효모를 만들어 맥주를 제조하는 토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스스로 수거해 ‘울트라부스트 팔라’ 운동화를 제작해 선보이기도 했다. 명품 브랜드들 역시 ‘양심’과 ‘가치’를 내걸고 업사이클링 상품을 등장시키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윤리와 양심을 자극해 ‘공정한 사고 팔기’ 정서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토종 업사이클링 브랜드 속속 등장
국내에서도 업사이클링은 ‘핫’하기 이를 데 없는 영역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출몰하고 있어서다.
밸리스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 업사이클링 펫푸드를 만드는 회사다.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배스를 활용하고, 목장마다 버려지는 젖소의 초유를 모아 반려동물 음식을 만든다. 메리우드는 폐목재, 코르크마개 등을 업사이클링해 가정용 소품과 장식용 목재 제품을 만든다. 파이어마커스는 실제 소방관이 사용하는 가방과 천 소재 등을 모은 뒤 새롭게 디자인해 각종 새 가방을 제작하고 있다. 큐클리프는 버려지는 우산의 폴리에스터 소재를 수거해 손지갑, 핸드백, 숄더백 등을 제조해 판매한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국내 최대 업사이클링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 29팀이 입주해 브랜드 운영과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어댄은 폐차의 시트가죽을 수거해 백팩과 숄더백 등을 만들어 판매한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랩몬스터가 모어댄의 가방을 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젠니클로젯은 기부받은 청바지로 여성용 핸드백을 만드는 브랜드다.
이처럼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들의 노력은 흔치 않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비자들에겐 생소하고, 일단 관심을 끈다 해도 꾸준히 팔려나가는 스테디셀러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커피찌꺼기에서 추출해 낸 커피오일로 보디워시, 젤리마스크, 보디스크럽 등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한 이니스프리는 예외적이다. 이니스프리는 대표적 화장품 기업인 태평양의 20대 여성용 브랜드다. 이니스프리는 ‘커피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커피를 사랑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에서 이 제품을 착안했다고 한다. 커피 한 잔 내리는 데 원두의 0.2%만 사용되고 나머지 99.8%가 버려지는 현실에서 커피찌꺼기는 충분히 화장품의 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전도가 유망하지만 아직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의 어려움은 작지 않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다보니 품질 관리나 애프터서비스,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이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제품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하기 일쑤”라며 “디자인으로 보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데 소재에 대해선 신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한국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 ‘양심적’ 소비에 대한 자각이 충분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