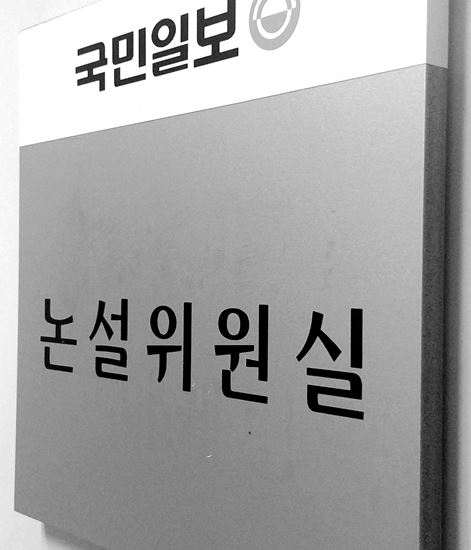
독서실에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다. 지방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처음 서울에 올라와 마땅한 거처가 없던 때였다. 하숙방이나 자취방에 비하면 독서실이 가장 쌌다. 밤에 최소한 양 옆자리 학생 두 명이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야 의자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누워 잘 수 있었다. 한 명이라도 가지 않으면 누울 공간이 없어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기도 했다. 엎드려 자다 보면 팔도 저리고 가슴도 답답했지만 할 수 없었다. 한여름이 가장 힘들었다. 에어컨은 없고 천장에 매달려 빙빙 돌아가는 선풍기뿐이었다. 그렇게 잔 다음 날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피곤했다. 체중도 많이 줄었다. 젊음이 좋다고 하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망설여질 정도로 팍팍한 생활이었다.
고시원에서 생활한 적도 있다. 독서실보다는 나았지만 좁고 창문이 없어 답답했다. 하루종일 혼자 있다보니 공부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차라리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됐다. 혼자 고립돼 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당시 고시원에는 나이 든 고시생들도 많았다. 말이 고시생이지 취직할 나이가 한참 지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고시 낭인들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 서울 신림동에서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고시원이 지금은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바뀌었다. 최근 서울 종로의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월 25만∼30만원 하는 곳이다. 방들이 벌집처럼 빼곡히 붙어 있고 창문이 없는 방도 있다.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시설도 없다. 사상자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 주택법에는 면적이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 놓은 ‘최저 주거기준’이 있다. 1인당 14㎡(4.2평)에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고시원은 예외다. 고시원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방이 좁고 창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많다. 전국 1만1000여개 고시원에 15만20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37만여명이 고시원, 쪽방, 숙박업소,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한다. 중년층이 60% 이상이고 청년들도 많다. 집값마저 폭등해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영국처럼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저축금의 일정 부분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고시원 화재 사고에 대해 “주거 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시 외곽에 있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먼거리를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도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신종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