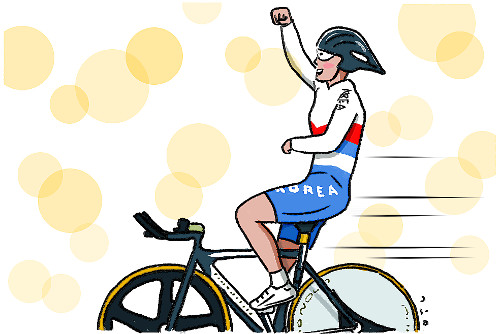

2006 도하아시안게임 3㎞ 개인추발과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35.6㎞ 도로독주의 금메달리스트인 전 여자 사이클 국가대표 이민혜(33)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다. 힘차게 페달을 밟던 그의 두 다리는 암세포로 부어올랐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의사는 “국가대표의 몸과 정신이라서 버티는 것”이라고 이민혜의 가족에게 말했다.
슬그머니 꼬리를 물던 상대 선수처럼, 백혈병은 2016년 8월 이민혜에게 다가왔다. 기를 쓰고 달아나도 병은 나가떨어지지 않았다. 14번의 입원, 12번의 방사선치료, 9번의 항암치료가 이뤄진 2년여간 2억원을 썼다. 이민혜의 어머니 최강희(59)씨는 “민혜가 자전거로 번 돈을 다 썼다”고 말했다.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든 딸 곁에서, 최씨는 “조그만 빌라가 하나 있다. 그걸 팔면 된다”고 말했다. 최씨가 힘줘 말한 빌라란 아무래도 연신내 반지하방의 반대말이다. 이민혜는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최씨는 식당 종업원, 신문 배달원, 골프장 캐디가 돼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다. 근면해도 넉넉하기 어려운 반지하방의 삶이었지만 최씨는 “어른들께 인사 잘 하고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딸을 가르쳤다.
최씨는 “민혜는 중고 자전거를 타고 1등을 했다”며 잠깐 눈물을 보였다. 20년 전에, 달리기를 잘하던 딸은 서울 덕산중 사이클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당시 선수용 사이클은 80만원이었다. 최씨는 감독을 찾아가 형편을 말했다. 감독은 “사이클을 사놓곤 운동을 관두겠다는 선배 선수가 있다”고 말했다. 20만원이었다.
제일 싼 자전거를 타는 딸은 제일 먼저 골인했다. 품에는 아버지의 사진을 넣고 달렸다. 매일 일하느라 딸의 시합을 못 본 최씨는 이민혜의 버릇을 몰랐다. 나중에 “왜 사진을 갖고 타느냐”고 물었다. 이민혜는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실 것 같았다”고 했다. 서울체고로 진학하자 새 사이클이 나왔다.
이민혜는 고3 때 태극마크를 달았고 3번의 아시안게임에서 7개의 메달을 가져왔다. 귀국하면 ‘효자종목’을 찾는 이들에게 불려가 사진도 찍었다. 금메달이 2개가 되자 매월 30만원의 연금이 나왔다. 이민혜는 방송에서 “어머니께 연금을 드리려 달렸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민혜가 아프기 전까지 그 돈을 쓰지 않았다. 효자의 다른 이름은 비인기였다. 최씨는 딸의 역주를 생중계로 본 적이 없다. 사이클 경기는 때로 야구나 축구 경기와 겹쳤다. 소리조차 없는 해외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거듭 새로고침해 랩타임을 읽으면서, 최씨는 딸이 나는 듯이 달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가슴 속에 또 아빠 사진을 넣고 달렸겠구나, 생각했다.
이민혜는 2016년 10월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없었지만 검은 모자를 쓰고 행사장에 갔다. 김연아도 있고 박인비도 와서 모녀는 ‘우리가 올 자리인가’ 하며 모처럼 밝게 웃었다. 병원비 내주지 않는 훈장도 마냥 좋았다. 맹호장을 본 의사가 인턴들을 불러 “대단한 환자 분이시다”고 소개했다.
소속팀 음성군청과의 계약은 지난해 말 끝났다. 최씨는 “아픈 애를 오래 데리고 있어 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누운 이민혜에게 삶의 의지를 붙잡게 한 사이클이었다. 이민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도 다 챙겨봤다. TV에 잘 안 나와서, 휴대폰을 쥐고 해외 중계를 봤다. 나아름의 레이스에 아픔을 잊고 환호했다.
본디 없던 빌라였고, 원래 없던 인기였다. 최씨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세상이다”고 말했다. 폐렴이 겹친 2개월 전, 이민혜의 백혈구 수치는 바닥을 향했다. O형 백혈구를 줄 가족이 없어 모녀는 병실에서 울기만 했다. 이민혜의 언니가 SNS로 수혈을 부탁했다.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그 글을 옮겼다. 수십명이 내 피를 뽑자며 찾아왔다. “이 더운 여름에….” 최씨는 울고 절하며 사람들을 맞았다.
정부나 대한체육회, 대한자전거연맹 사람들은 병실을 찾지 않았다. 바쁜 국가가 비인기 효자 하나하나를 기억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최씨도 “상해가 아닌 질병이다. 돈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른 국가대표가 아프면, 그땐 전화 한 통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민혜가 만일 걷게 되면 기자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다. 그가 아픔을 따돌리고 멋있게 골인하는 장면만큼은 생중계하고 싶다.
이경원 스포츠레저부 기자 neosar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