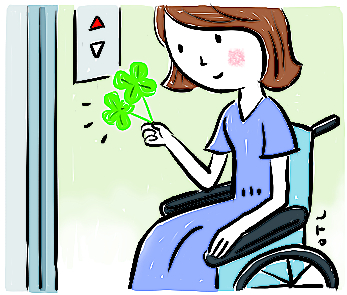
승강기 문이 열렸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내 무릎 위로 풀잎 두 개가 사뿐히 내려앉았다. 연한 초록빛의 네 잎 클로버였다. 잠시 멍하니 클로버를 바라보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서둘러 시선을 들어 그걸 내 무릎 위에 내려놓고 승강기에서 내린 사람의 뒷모습을 좇았다. 샛노란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 슬리퍼 차림의 남자였다. 곧 승강기 문이 닫혔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무릎 위에 놓인 클로버를 골똘히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향하던 행운이 방향을 틀어 내게로 온 느낌이었다.
이제 더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용케 멀쩡한 구석을 찾아내 그마저도 망가뜨렸다. 눈 두는 곳마다 공포와 혐오가 뒤엉켜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마음 두는 곳에선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 나갔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서 힘없는 이들만 넘치는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압사했다. 약한 이들과 더 약한 이들의 싸움은 끝이 없었고 싸움의 설계자들은 승승장구했다. 요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랬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테지만, 적지 않은 부분이 지나친 비관이었을 것이다. 사실, 비관주의의 정점을 찍을 만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긴 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비된 두 다리 대신 다리의 역할까지 해오던 팔마저 다치는 바람에 지난 몇 주간 침대 위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배변까지 해야 했다. 그사이 아픈 몸만큼이나 정신도 지쳐버렸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리 없었다. 그렇다면 내게 네 잎 클로버를 건네고 간 그는 어땠을까. 평일 한낮의 대학병원이었다. 차림새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오래 아팠거나 병간호를 해온 이일 수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도 세상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일면식도 없는 내게 제 몫의 행운을 나눠주었다. 세상엔 여전히 그런 이들이 존재했다. 그가 건넨 행운이 무릎 위에 내려앉는 순간,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 덕분에 더께더께 쌓인 비관을 털어낼 수 있었으니, 내게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황시운(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