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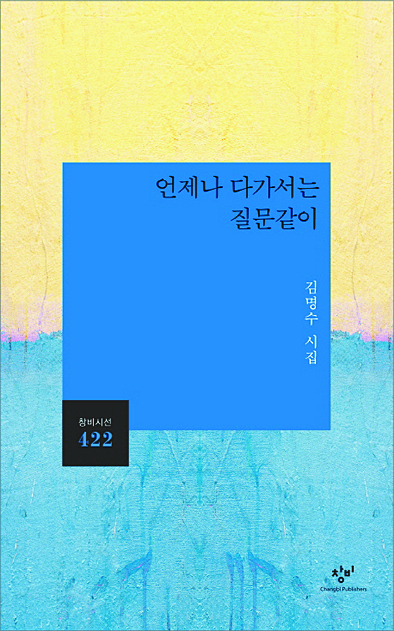
어릴 적 이름은 ‘해수’였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명에 ‘해(解·풀다)’를 넣었다. 유년기에 목격한 6·25전쟁의 참상과 전후 황폐함의 기억은 그에게 문학의 근간이 됐다. 77년 ‘월식’으로 등단한 후 열 번째 시집 ‘언제나 다가서는 질문같이’(창비)를 낸 시인 김명수(73)를 최근 서울 마포구 창비 사옥에서 만났다.
“시는 존재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해요. 시인은 결국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어디로 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나를 둘러싼 사회에 대해 성찰해야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의 정체를 살펴보게 되겠지요. 시는 인간이 그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해요.”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느리고 낮은 목소리였다. ‘부서진 파도는 되밀려가네/허공에 입 맞춘 타는 그 입술/메마른 입술이 입 맞춘 허공/병사들, 병사들 모든 병사들//언제나 무거운 물음같이/원방의 어두운 그림자처럼/언제나 다가서는 질문같이/어제도 오늘도 모든 병사들.’ 표제작 ‘언제나 다가서는 질문같이’ 일부다. 분쟁의 희생자인 ‘병사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시다. 여기에서 ‘병사들’은 총을 든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표류하는 난민 등과 같은 약소자를 총칭한다. 이 시에 대해 얘기하다 그는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에 대해 언급했다.
“‘지중해 두만강’이란 시에도 썼는데 우리 민족이야말로 오랜 시간 난민으로 떠돌지 않았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북간도에 가서 살고 6·25전쟁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제주 4·3사건 땐 일본으로 밀항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걸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활동 초기부터 어두운 현실을 날카로운 직관으로 꿰뚫어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아이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아니다 아니다”라고 읽으니/“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그렇다 그렇다!”라고 읽으니/“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군사 정부의 서슬이 퍼렇던 1983년 그가 발표한 ‘하급반 교과서’다. 40년 넘게 시를 써온 그가 이번 시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무엇이었을까. “바야흐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시는 한없이 초라하지만 이 시집에 주안점을 둔 건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자유였어요.”
그의 외가 친지들은 북한에 살고 있다. “얼마 전에 사촌을 만나고 싶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앞으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하지만 그는 삶의 아픔이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보려 애쓴다. ‘물어본다, 물어본다/못 물어봤던/황매화는 어느 때/누가 심으셨나요?//아버지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추운 겨울이 심어주었다/전쟁이 그 꽃을 심어주었다’(‘전쟁이 그 꽃을 심어주었다’ 중) “어딜 가든 늘 꽃을 심고 가꾸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시에요. 전쟁 때 큰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겨울을 이기고 개화한 나무를 보면서 더 큰 환희를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결국 아름다움이 폭력과 살의에 맞서는 힘이 될 것이고요.”
지난해 겨울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을 시로 옮긴 ‘촛불셈법’도 이번 시집에 수록돼 있다. 번역자이자 아동문학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한 그는 그동안 신동엽창작상, 오늘의작가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시가 나한테 오면 시를 계속 쓰겠지요”라며 웃었다.
녹색당 당원인 그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페미니스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는 시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 세계가 나아가는 데 묵묵히 복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